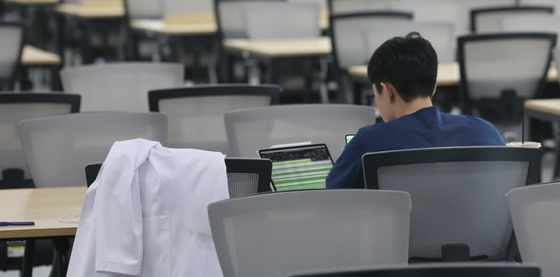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동해 지진] ① 안심은 금물, 역사가 보낸 '위험신호'…"안전지대 아냐"
강원 20세기 이후 평창 4.8·정선 4.5 지진…"도시·해양·항만 대책 강구해야"
[※ 편집자 주 =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벌써 44차례입니다.
동해안 연속 지진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역사 속 지진사례를 되짚고, 동해안 지진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지진대피소의 운영 실태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리는 기획 4편을 송고합니다.
]
![[동해 지진] ① 안심은 금물, 역사가 보낸 '위험신호'…"안전지대 아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PCM20190730000065990_P4.jpg)
기상청이 2011년 발간한 '한국기상기록집① 삼국사기·삼국유사로 본 기상·천문·지진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에는 기상기록 424건, 천문기록 218건, 지진기록 88건이 수록돼있다.
삼국유사에는 기상기록 8건, 천문기록 5건, 지진기록 2건만이 남아 있다.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지진 기록은 서기 2년 '가을 8월에 지진이 났다'는 기록이다.
삼국사기에 나온 지진 횟수를 연대별로 나눠보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각 10회, 4∼5세기 각 5회, 6세기 6회, 7세기 12회, 8세기 19회, 9세기 7회, 901∼934년 4회 등 총 88회다.
이처럼 역사 기록에는 지진 규모와 장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지진 발생 사실만 남아 있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조선시대부터 그 기록이 두드러지게 늘어난다.
국내에 지진계가 설치된 게 1905년임을 고려하면 역사지진 기록에는 모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진의 공간적·시간적 분포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동해 지진] ① 안심은 금물, 역사가 보낸 '위험신호'…"안전지대 아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C0A8CAE20000016370E0CB2A0000055D_P4.jpg)
이 기록집에 따르면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발생한 지진은 총 2천161회다.
진도별 발생 빈도를 보면 대부분 진도 4 이하이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도 5 이상 지진은 이상 지진은 440회(20.4%)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성첩이 무너지고 지면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 정도인 진도 8∼9 지진은 15회 있었다.
이 중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된 건 779년 신라 혜공왕 15년 3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경도(현 경주)에 지진이 있어 민옥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100여명이었다'고 기록돼있다.
유일하게 사망자 숫자가 적힌 지진 기록으로, 숫자의 정확도와 관계없이 인명피해가 컸음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다.
나머지 지진들은 '민가가 무너져 사망자 다수', '집이 무너지고 사망자 발생', '담과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사망함' 등 숫자까지는 집계돼있지 않다.
1518년 6월 22일 '팔도에서 성과 집이 무너짐', 1643년 6월 9일 '팔도에 지진 발생', 1714년 3월 15일 '팔도에서 지진으로 장문(狀聞)함'이라는 기록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지진 피해가 났음을 헤아릴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1643년 7월 24일 '울산부(현 울산)에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바다 가운데 큰 파도가 육지로 1, 2보 나왔다가 되돌아가는 것 같았다'는 기록과 1681년 6월 12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파도가 진동하고 끓어올랐으며, 해변이 조금 작아져 마치 조수가 물러난 와 같았다'는 기록에서는 지진해일이 뒤따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해 지진] ① 안심은 금물, 역사가 보낸 '위험신호'…"안전지대 아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PYH2023042619540001300_P4.jpg)
당시 주민들은 한밤중에 건물이 요동치자 매우 놀라 급히 밖으로 대피했으며, 지진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원인을 몰라 불안에 떨었다.
이 지진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진부면 경계에서 발생해 일명 '오대산 지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대산 지진 다음으로 강력했던 건 1996년 12월 13일 정선군 사북읍 남쪽과 영월군 상동읍 경계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또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북에서도 2016년 9월 경주 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 지진(규모 5.4)이 발생했을 때 강원 도내 피해는 없었으나 유감 신고가 쇄도할 정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다.
각종 연구기록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를 경고하는 학자들의 목소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됨을 일깨운다.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0㎞ 안팎 떨어진 해역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총 36차례(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포함) 지진이 발생했다.
이른 아침 발생한 지진에 놀라 잠에서 깬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으나 피해는 없었다.
동남해안을 따라 자리한 원자력발전소 역시 영향은 받지 않았으며, 지진해일(쓰나미)도 일지 않았다.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밀려올 정도가 되려면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가 6.5 이상 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남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진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재해가 아니라 과거에도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발생했다"며 "한반도 차원의 중대 재난 대비와 도시·해양·항만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