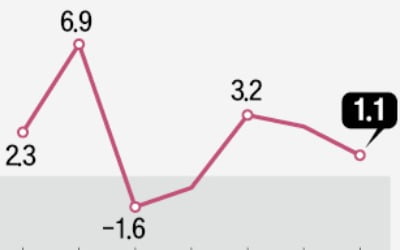외로움이 이렇게나 아름다웠던가…'고독의 화가' 고정관념을 깨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립미술관
에드워드 호퍼 한국 첫 회고전
푸른 저녁·황혼의 집·뉴욕 실내…
사람의 표정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고독·외로움·후회·지루함 포착해 작업
다채로운 풍경화·서정적 수채화도 눈길
40대부터 거장으로 평가받은 호퍼
1층 공간엔 작가 기록물 110점 전시
에드워드 호퍼 한국 첫 회고전
푸른 저녁·황혼의 집·뉴욕 실내…
사람의 표정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고독·외로움·후회·지루함 포착해 작업
다채로운 풍경화·서정적 수채화도 눈길
40대부터 거장으로 평가받은 호퍼
1층 공간엔 작가 기록물 110점 전시

‘고독의 화가’로 불리는 20세기 미국의 대표 화가 에드워드 호퍼(1882~1967)는 생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다. 세상을 관찰하고 느낀 인상을 그림에 그대로 표현했을 뿐 결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을 그린 건 아니라는 항변이었다. 실제 그의 삶은 외롭지 않았다. 40대부터 거장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아내인 조세핀 니비슨과 한평생 해로했다. 하지만 호퍼 생전부터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고립과 단절, 소외의 상징으로 곧잘 읽힌다.
‘외로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장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한 호퍼의 국내 첫 회고전 ‘길 위에서’는 이 같은 ‘호퍼=고독’이라는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는 전시다. 도시인의 고독을 드러낸 작품뿐 아니라 다채로운 색상의 풍경화, 아내와의 일상을 그린 서정적인 수채화, 작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 대거 나와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은 총 160여 점. 호퍼의 작품과 기록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뉴욕 휘트니미술관과 협업했다.전시장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작가의 자화상과 초기작을 지나 호퍼가 32세 때 프랑스 파리에서 그린 작품 ‘푸른 저녁’(1914)을 만나게 된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등장인물과 가라앉은 색채에서 특유의 고독한 정서가 배어 있다. 이후 나오는 ‘황혼의 집’(1935)과 ‘뉴욕 실내’(1921),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빌려온 ‘밤의 창문’(1928) 등도 잘 알려진 호퍼 작품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뉴욕의 일상 풍경을 표현한 에칭 판화와 수채화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고 치밀한 화가

미술계 일각에서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시카고미술관 소장) 등 국내에 잘 알려진 호퍼의 대표작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외로움’을 넘어 호퍼의 작품 세계를 깊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드문 기회다. 초기작부터 말년 작품까지 거장의 붓 터치를 직접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작가가 어떻게 예술을 성숙시켜 나갔는지 알 수 있어서다. 전시는 8월 20일까지 예약제로 유료 관람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