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시선] 미·중 충돌과 태국 '대나무 외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파원 시선] 미·중 충돌과 태국 '대나무 외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PTA20221118022801009_P4.jpg)
143개국 찬성, 5개국 반대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된 가운데 태국의 표가 파장을 일으켰다.
태국은 중국, 인도 등 34개국과 함께 기권했다.
태국 언론도 비중 있게 다룰 만큼 예상 밖의 선택이었다.
서방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태국은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10월 기권표는 '배신' 혹은 '변심'으로 비칠 만도 하지만, 태국의 외교 행보를 보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을 찾아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며 유대를 과시했다.
며칠 뒤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해 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우방'임을 강조했다.
중국과 '가족 같은 사이'이자 미국의 '오랜 친구'인 태국은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군사 부문에서도 두 나라 사이를 넘나든다.
탱크, 잠수함, 상륙강습함 등 중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한 태국은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를 추진 중이다.
8월 중국과 연합 공군 훈련을 했고, 내년에는 미국과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기로 했다.
태국의 '자유분방한' 외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러시아산 연료, 식품, 비료 수입 등을 논의하는 등 러시아와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파원 시선] 미·중 충돌과 태국 '대나무 외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PTA20221118023101009_P4.jpg)
역사적으로 태국 외교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해서 '대나무 외교'로 불린다.
동남아 주변국들이 모두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에도 태국은 유연한 외교 전략으로 독립을 지켜냈다.
미얀마타임스 편집장 출신인 국제전문가 카위 총키타완은 방콕포스트 칼럼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작은 나라들처럼 태국은 서구의 식민지화에서 나라를 구한 외교술로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으나 최근 수년간은 중국으로 기운 듯했다.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정권에 미국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계가 냉각되자 중국에 밀착해왔다.
미국이 한동안 소원했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태국이 양강의 '구애'를 받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동남아는 세계 패권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은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 확대에 공을 들이는 지역이다.
피아가 명확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지 않았기에 제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동남아 국가들의 '몸값'이 뛰는 이유다.
동남아의 리더 역할을 했던 태국이 최근에는 지나치게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미얀마 사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대나무 외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타니 상랏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 매체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대나무 외교에 대한 경멸과 비판이 있지만 태국은 다른 나라가 아닌 태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유엔과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국제 원칙을 지지한다"며 "그래서 태국이 모든 외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과 균형 속에 자국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분까지 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태국은 18일 방콕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도약의 기회로 삼으면서 갈등의 중재자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처한 외교적 상황과 전략은 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외교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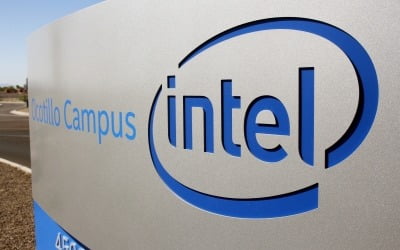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