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통증 치료하려면 환자 삶부터 이해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버드의대 교수가 쓴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 출간

"처방전을 쓰는 건 쉽지만,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건 어렵다.
"
20세기 문학의 거장 프란츠 카프카의 말이다.
문학에 대한 이야기지만 환자와 깊이 공감하는 기회가 적은 의료계의 현실을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서 클라인먼 하버드대 의대 교수도 카프카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최근 번역 출간된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사이)를 통해 만성질환을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선 환자가 경험한 삶의 궤적을 꼼꼼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허리통증, 관절염, 천식, 당뇨, 심장병, 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20여 명의 사연을 전하며 병을 파악하는 데 환자의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
그는 미국 소도시에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하워드 해리스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소개한다.

해리스는 20여 년간 허리 통증을 앓았다.
수술만 네 차례 받았고 대학병원부터 한방까지, 틈만 나면 치료를 받으러 갔다.
잦은 휴가로 직장에서 입지는 날로 좁아졌다.
가정도 엉망이 됐다.
제 한 몸 돌보기도 벅차 자식 돌봄은 늘 아내의 몫이 됐다.
휴일에도 그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통증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다.
대학생이 된 아들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아버지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증오했다.
심지어 그를 오랫동안 치료한 주치의마저도 해리스를 "문제적 환자"로 여겼다.
아무리 치료해도 해리스는 단 한 번도 호전된다고 말하지 않았고, 병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해리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해리스의 통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해리스의 통증은) 정서적으로 가깝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없이 성장한 어린 시절, 자신의 약점과 무능함, 의존성에 대한 걱정 등이 모두 얽혀 있는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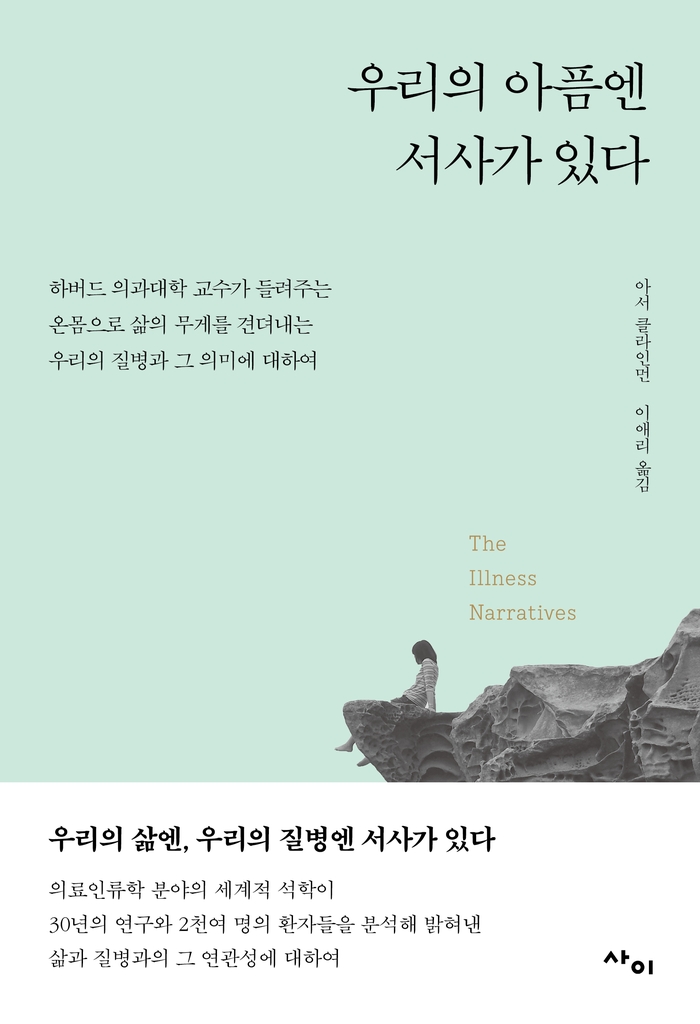
책에는 해리스의 사례 외에도 삶이 주는 절망감에 녹초가 된 40대 여성, 마흔 번째 생일에 갑자기 천식이 시작된 변호사, 질병이 주는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28세 제빵사 이야기 등 다양한 서사가 나온다.
이를 통해 저자는 환자 서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는 통찰력 있는 의사는 환자들의 질병 서사가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처럼, 진단, 예후, 치료의 구성이 자신의 인식 범위 밖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책은 1988년 미국에서 초판이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 여러 의과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적인 내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사례 중심이어서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애리 옮김. 476쪽. 2만4천원.
/연합뉴스

"
20세기 문학의 거장 프란츠 카프카의 말이다.
문학에 대한 이야기지만 환자와 깊이 공감하는 기회가 적은 의료계의 현실을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서 클라인먼 하버드대 의대 교수도 카프카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최근 번역 출간된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사이)를 통해 만성질환을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선 환자가 경험한 삶의 궤적을 꼼꼼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허리통증, 관절염, 천식, 당뇨, 심장병, 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20여 명의 사연을 전하며 병을 파악하는 데 환자의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
그는 미국 소도시에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하워드 해리스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소개한다.

수술만 네 차례 받았고 대학병원부터 한방까지, 틈만 나면 치료를 받으러 갔다.
잦은 휴가로 직장에서 입지는 날로 좁아졌다.
가정도 엉망이 됐다.
제 한 몸 돌보기도 벅차 자식 돌봄은 늘 아내의 몫이 됐다.
휴일에도 그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통증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다.
대학생이 된 아들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아버지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증오했다.
심지어 그를 오랫동안 치료한 주치의마저도 해리스를 "문제적 환자"로 여겼다.
아무리 치료해도 해리스는 단 한 번도 호전된다고 말하지 않았고, 병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해리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해리스의 통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해리스의 통증은) 정서적으로 가깝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없이 성장한 어린 시절, 자신의 약점과 무능함, 의존성에 대한 걱정 등이 모두 얽혀 있는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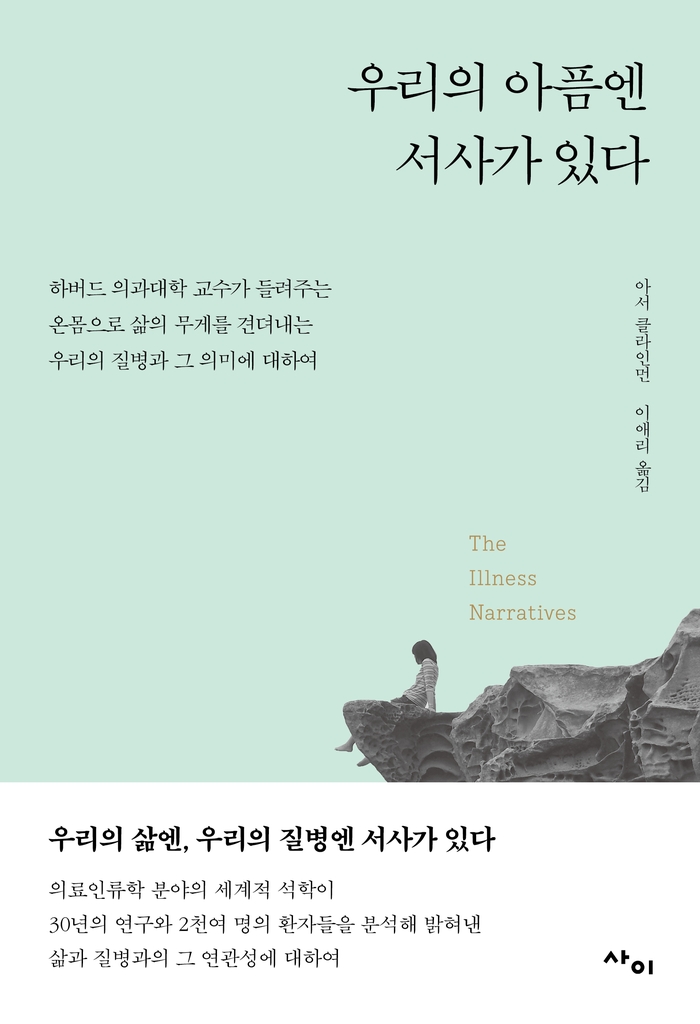
이를 통해 저자는 환자 서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는 통찰력 있는 의사는 환자들의 질병 서사가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처럼, 진단, 예후, 치료의 구성이 자신의 인식 범위 밖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책은 1988년 미국에서 초판이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 여러 의과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적인 내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사례 중심이어서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애리 옮김. 476쪽. 2만4천원.
/연합뉴스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