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쿨란스키 지음 / 김정희 옮김
와이즈맵 / 472쪽|1만9000원
'음식 역사 전문' 미국 논픽션 작가
1만년 전부터 동물 키우며 우유 마셔
로마시대엔 '하층민이 먹는 음료' 인식
1800년대 오염된 생우유로 영아 사망
파스퇴르, 저온 살균 개발후 사망률 '뚝'
우유로 본 문명의 변화는 제대로 못그려

이렇게 위험한 우유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가 됐을까. 인간은 언제부터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을까. <우유의 역사>는 그 답을 찾아나선다. 저자는 음식의 역사를 주로 써온 미국 논픽션 작가 마크 쿨란스키다. 물고기 대구가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는지를 다룬 <대구>는 1997년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소금> <연어> <커다란 굴> 등도 썼다.
사실 ‘인간이 우유를 마신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다른 동물의 젖을, 그것도 다 큰 어른이 마신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소와 양, 코끼리, 원숭이, 고래 등 모든 젖먹이 동물은 새끼 때만 젖을 먹는다. 커서는 젖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다. 유당(락토스)을 분해하는 락타아제가 나오지 않아 억지로 젖을 먹으면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바로 ‘유당불내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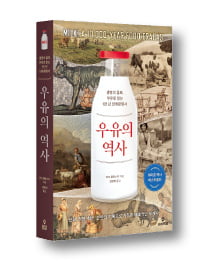
돌연변이의 시작은 아기에게 동물의 젖을 물리면서일 수 있다. 아기를 버리는 일이 흔했던 고대에는 갓난아이가 동물의 젖을 먹고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 로마 시대 우유가 꽤 대중화됐다. 그래도 우유는 하층민이 먹는 음료란 인식이 강했다.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농장 근처 농사꾼들이 주로 우유를 마셔 굳어진 이미지였다.
1800년대 들어 도시의 성장과 함께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급증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은 유제품 없이 못 사는 네덜란드인들이 정착한 곳이다. 식민지 초기에는 낙농 중심지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소가 자라는 환경이 열악했다. 1840년 무렵 맨해튼에서 태어난 아기의 절반가량이 영아 때 사망했다. 금주 운동가 로버트 밀햄 하틀리는 우유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정물 우유’라고 표현했다. 수많은 낙농가가 문을 닫았지만 사망자가 계속 나타났다.
맨해튼 이스트강 랜들스아일랜드에 있는 한 보육원은 직접 소를 길렀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질 좋은 우유를 아이들에게 먹였다. 그런데도 1895~1897년 3900명 어린이 가운데 1509명이 숨졌다. 나단 스튜라우스라는 사람이 나섰다. 파스퇴르의 ‘저온 살균법’을 신봉했던 그는 이 섬에 저온 살균 공장을 지었다. 그 후 보육원 아동의 사망률은 42%에서 28%로 뚝 떨어졌다. 파스퇴르는 1870년대 저온 살균법을 개발했지만 보급이 느렸다. 사람들은 근거 없이 저온 살균하면 우유의 맛이 떨어지고, 영양이 파괴된다며 생우유를 고집했다. 하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08년 시카고에 이어 1912년 뉴욕에서 우유 저온 살균을 의무화했다.
우유는 산업화와 품질 개량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미국 젖소 수는 1850년 약 658만 마리에서 1944년 2560만 마리로 급증했다가 지금은 약 900만 마리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우유 생산량은 더 많다. 젖소 한 마리가 평생 생산하는 우유는 평균 9513㎏이다. 1944년의 2265㎏보다 네 배 더 많다.
저자는 우유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소개한다. 버터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미국에서 냉장고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뤄졌다거나, 2차 세계대전 기간 자원 낭비라고 생각해 영국과 이탈리아가 아이스크림을 금지했다는 이야기 등이다.
다만 ‘우유로 읽는 1만 년 인류 문명사’란 부제와 달리 우유가 어떻게 인간과 사회를 바꿔 놓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우유의 문명사적 본질보다는 우유와 유제품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고, 요리법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책마을] 녹초될 때까지 매일 야근했는데…'가짜 노동'이었다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0907790.3.jpg)
![[책마을] 직장과 '헤어질 결심' 전, 7단계 결정과정 거쳤나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0904559.3.jpg)
![[책마을] 前 증권사 CEO의 조언 "장기투자 신화는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090457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