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권씩 출간 계획…"생생한 지역 목소리 전할 것"

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기도 하죠. 지역에는 메신저들이 많지 않아요.
지역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좋은 이야기,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
경남 통영의 작은 출판사인 남해의봄날 정은영 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판사 검색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등록 출판사는 9만7천992곳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출판사 비율이 79.9%(7만8천311곳)다.
이처럼 지역 출판사 수가 적다 보니 고유한 이야기 소재 발굴과 보급도 쉽지 않다고 한다.
서울 홍대 앞에서 스토리텔링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년 통영으로 내려가 올해 출판사 창립 10주년을 맞은 정 대표는 지역 목소리를 외부에 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전국의 작은 지역 출판사 5곳이 의기투합해 내놓은 첫 인문 시리즈 '어딘가에는 @(앳) 있다'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정 대표를 주축으로 온다프레스(강원 고성), 포도밭출판사(충북 옥천), 이유출판(대전), 열매하나(전남 순천)가 참여했다.
프로젝트는 출판사와 책방을 운영하던 정 대표가 2020년 가을 평소 눈여겨본 출판사들에 제안해 이뤄졌다.
출판사 나이는 3∼10살로 다르지만, 대표들 모두 서울에서 각 지역으로 옮겼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말이 통할 것 같았다"며 "책을 단단하게 잘 만드는 곳들인데 돌아보면 인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출판사 대표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공이 있는 이른바 '은둔 고수',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려는 젊은 청년 등에 주목했다.
논의 과정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독특한 지역의 문화도 다뤄보자는 의견이 모였고, 콘텐츠의 큰 방향만 정한 뒤 저자 및 주제 선정 등은 출판사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했다.
또 지역성을 돋보이게 하되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다.
한글 서체 디자이너 안삼열 씨는 디자인을 맡아 책 내용에 어울리는 글꼴을 넣었다.
다섯 권 중 두 권에 들어간 안씨의 글꼴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이동행 작가의 '어딘가에는 아마추어 인쇄공이 있다'(온다프레스)는 태백에 정착해 인쇄 관련 일을 하는 작가 부부의 삶을 말한다.
한인정 작가의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포도밭출판사)는 편견과 핍박에 맞서 싸우는 옥천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임다은 작가의 '어딘가에는 도심 속 철공소가 있다'(이유출판)는 70년 역사의 대전역 인근 철공소 거리에서 만난 장인 세 명의 삶을 전한다.
장성해 작가의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열매하나)는 순천 출신 청년이 생태 도시와 지속가능한 정원을 꿈꾸는 이야기를 담았고, 정용재 작가의 '어딘가에는 원조 충무김밥이 있다'(남해의봄날)는 통영 명물 충무김밥과 향토사를 엮었다.

아이디어 취합, 디자인과 편집, 인쇄, 마케팅 등 논의가 모두 화상 회의로 이뤄졌다.
지난해 초부터 매달 한 차례, 책이 나올 무렵 수시로 모인 횟수를 합치면 30여 회에 달한다.
이들은 책이 나온 후인 지난달 3일 통영에서 2년 만에 처음 만났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섯 명의 의견을 교환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대면 만남은 딱 한 번이었지만 물리적 거리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졌다.
출판사별로 계약된 인쇄소에서 출력과 제본을 하다 보니 연노랑 표지색이 미세하게 다른 게 '옥에 티'였다.
정 대표는 '독수리 5형제'라는 표현을 쓰며 "다섯 명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결과물을 냈다는 것"에 주목해 달라고 했다.
특정 출판사에만 관심이 몰릴까 봐 조심스러워하면서 책 홍보도 '5권 세트'로 하고 있고, 통영에서 만났을 땐 다섯 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처럼 권역별 새 이야기를 매년 5권씩 펴낼 계획이다.
"지역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면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그냥 하나씩 '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 정보 교환도 쉽지 않죠. 매달 회의하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완벽한 원팀이었어요.
"
/연합뉴스


![순모 실타래 같은 ‘모계의 꿈’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2667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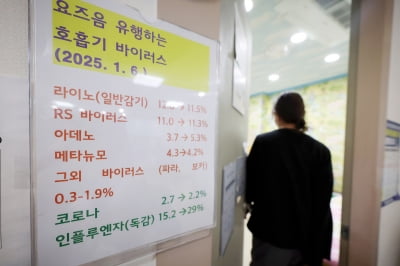
![[단독] "5년치 일감 쌓여"…미국서 '돈벼락' 맞은 한국 기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0957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