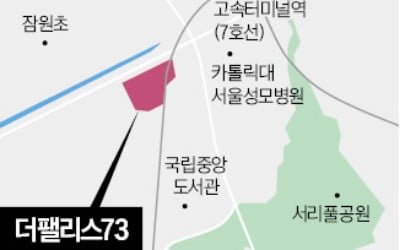[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경매의 함정, 후순위 가처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이번 글은 필자의 이전 글 중 ‘경매, 투자자 책임 없이 실패할 수 있다’에 이어 후순위 가처분 등기의 사례를 들어 조심해야 할 가처분등기와 관련해 글을 이어가도록 한다. 경매 투자에서 가장 황당한 것이 경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이다. 거의 모든 권리는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말소기준등기) 이후 낙찰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끔 죽는 줄 알았던 권리가 살아있어(?)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경우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매에 있어 '후순위 가처분'의 일부 사례이다.
원래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로 등기된 가처분은 새로운 경매의 낙찰자가 생기면 기존의 가처분은 낙찰로 인해서 소멸된다. 그러나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아래 글에서 박 씨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미 사례의 경매사건은 배당까지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알고 보니 그는 재산이 무일푼인 신세였다.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해 벙어리 냉가슴만 앓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
박 씨는 지난해 연말 토지공사로부터 협의 수용 보상가를 통보받고 또 한 번 쓴맛을 맛보아야만 했다. 원래 취득한 지분대로라면 수용 보상가가 지장물 가격을 포함하여 83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소유권을 일부 상실하지 않았다면 6개월 만에 세전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취득면적 중 각각 1/2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관계로 협의 보상가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령했기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시 정상적으로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까지 합하면 결국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만 것이다.
경매 입문 10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박씨. 비록 쓰린 속을 달랠 길이 없지만 결코 비싼 대가를 치룬 것만은 아니다. 이는 비록,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비록 전문가일지라도 얼마든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에 관심 있는 소액 경매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 부담'되는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기부상의 권리 - 예고등기, 선순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선순위가처분, 배당요구 없는 선순위전세권, 대항력 있는 등기된 임차권, 선순위지상권, 선순위환매특약, 선순위지역권 등
▲ 등기부상 이외의 권리 -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배당요구 없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의 임차보증금(주거용 및 상가건물) 등이 있다.
☞ 후순위 가처분이란?
- 말소기준등기보다 뒤에 등기된 후순위 가처분등기는 말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나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건물에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다.
- 이런 경우의 가처분 등기는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어도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그런 연유로 집행법원은 이를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피보전권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등기소로부터 가처분신청서 등본을 교부받아 물건명세서에 첨부한다.
▲ 가처분등기의 원인이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 예를 들어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자로 그리고 병이 가처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병이 가처분을 한 이유가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갑은 단순히 등기명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인 때에는 후순위거가처분등기의 말소여부와는 관계없이 경매로 낙찰 받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시력을 인정하므로 생기는 결과다.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한 사람보다 실제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을 공시력이라 하고 피해자가 원소유자이더라도 등기부의 소유자를 믿고 거래한 새로운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신력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없으며, 따라서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연유로 그런 결과가 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