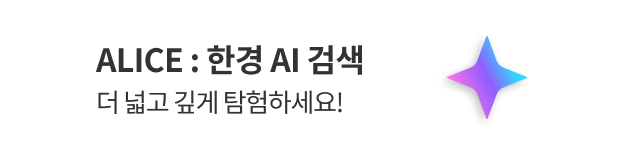사외이사 2명 후임 못정한데다
자회사 4곳 CEO도 인선 차질

기업은행은 절차에 따라 후임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인 신 이사의 임기를 후임 이사 선임 때까지 연장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 김 전 이사는 이미 한화생명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겨 결국 퇴임했다.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과 IBK투자증권, IBK신용정보 등 3개사도 임기가 끝난 대표가 어정쩡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의 임기는 지난달 19일 만료됐지만 이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IBK캐피탈은 그동안 기업은행 부행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아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 후임 인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IBK투자증권도 지난달 30일 주총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했다. 임기가 끝난 서병기 대표의 연임이나 교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창호 IBK신용정보 대표의 임기도 지난 5일부로 만료됐다.
오는 23일 양춘근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IBK연금보험까지 합치면 기업은행 8개 자회사 중 절반인 네 곳에서 상당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행 자회사는 민간 금융회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최고경영자(CEO) 인사가 지연되면 신규 사업 등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논란만 보더라도 (산하 기관 인사를 전면 보류한) 금융위 측 입장이 이해는 간다”면서도 “정부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민간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행의 정상적인 인선마저 멈춰 세운 것은 과도한 형식 논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