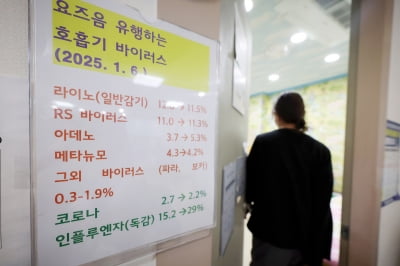보잘것 없는 존재로 본 삶의 의미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인 정호승이 최근 펴낸 우화소설집 《산산조각》(시공사·사진) 속 주인공들이다. 올해 등단 50주년을 맞은 그는 17편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본다.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수의’의 주인공은 판매점에 진열된 수의다. 그는 “아름다운 여성의 한복이나 늠름한 남자의 두루마기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늘 나를 괴롭힌다”고 토로한다. 몇 해 전 판매점 주인 김씨는 ‘주머니 달린 수의’를 판다고 광고했다. 그러곤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머니에 무엇을 넣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돈을 넣고 싶다고 하자 표정이 굳어지며 수의를 만들 수 없다고 해버린다. 어느 날 여든을 훨씬 넘긴 어르신이 찾아오고 김씨는 드디어 주머니 달린 수의를 만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르신은 찾으러 오지 않고, 수의는 진열된 채 몇 해가 흘러버린다. 아쉬움을 토로했던 바로 그 주인공 수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 책의 주인공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17편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화두다. ‘숫돌’의 주인공 숫돌은 군데군데 패고 홀쭉해진 자기 몸을 발견하고 더 이상 칼 갈기를 거부한다. ‘걸레’의 주인공은 남자의 팬티였다가 헤어져서 걸레로 전락한 뒤 서러운 시간을 보낸다. 숫돌과 걸레는 긴 세월을 견딘 벼루와 행주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참나무 이야기’에선 대웅전의 대들보나 목불(木佛)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던 참나무가 장작이 돼버린다. ‘선암사 해우소’의 바윗돌은 더러운 변소의 기둥을 받치는 신세가 된다. 꿈꾸던 미래와 안락함을 빼앗겼지만 둘은 낙담하지 않는다. 묵묵히 견디며 삶의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른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듯 ‘나’ 역시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이 세상에 왔고, 살아가야 할 이유 또한 명백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정 시인은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그 가치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화의 방법으로 성찰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한국 현대시, 한시로 만나다] 풍경 달다, 정호승](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7940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