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케이건 지음 / 홍지수 옮김
김앤김북스 / 223쪽│1만3500원
세계 평화 유지한 자유주의 질서
균형자 역할, 미국이 지켜왔지만
최근 中·러시아 등 '영토 쟁탈' 시동
모두가 투쟁하는 '정글' 눈앞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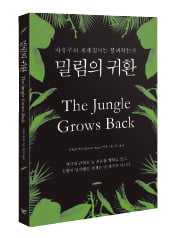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계는 역사의 필연적 결과도 아니고, 거친 외풍(外風)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자생력이 강하지도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일군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결코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1945년까지만 해도 전쟁과 폭정, 가난으로 점철됐다. 민주정체는 희귀했고 풍요는 소수나 누리는 사치였다.
1930년대만 해도 자유주의의 ‘앞날’은 암담했다. 18세기 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러시아에서 탄생한 경찰국가는 19세기와 20세기에 꾸준히 그 면모가 다듬어졌다. 1918년 이후 대륙마다 60개 이상의 나라에서 공산당이 등장했다. 1919년 26개 의회 민주제 국가가 등장했지만 20년 뒤엔 불과 12개만 살아남았을 뿐이었다. 자유주의를 향한 꾸준한 진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의 전개는 자유주의의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의도치 않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세계사에 찾아보기 드문 자유주의 세력이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균형자이자 평화를 수호하는 책임을 떠안았다. 미국의 선택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이전 세대의 영국이 인지하지도, 감내하려 하지도 않았던 부담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미국은 세계의 정원사 역할을 자처했다.
이 같은 역사의 예외가 빚어낸 결과는 화려했다. 미국은 민주정체의 전통이 약하고 낯설었던 독일과 일본을 민주화했다. 그 결과 2차 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3.5% 성장했다.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경쟁만 존재했던 토양에서 협력이 꽃피었다. 성장의 혜택은 서유럽과 일본을 넘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4마리 용’에 이어 중국과 베트남으로 넘쳐 흘렀다. 세계적으로 40억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1939년 불과 한 줌에 불과했던 민주정체 정부는 오늘날 10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예민하고 연약한 식물로 가득 찬 정원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세 잡초와 넝쿨이 넘보는 상태가 됐다.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역사적 우연이 빚어낸 예외에 불과한 만큼 뿌리가 깊지 못했던 탓이 컸다. 러시아와 동유럽, 중동의 독재자들은 비자유주의적 성향을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나섰다. 중국은 오히려 자국이 세계의 본보기라고 내세우고 있다. “히틀러가 귀환하는 게 가능한지가 더는 의문이 아니라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지가 문제”라는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프의 발언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설상가상 한물간 것으로 여겨졌던 영토 쟁탈의 화약 냄새가 세계 각지에서 감지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중국은 언제라도 대만을 침공할 태세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의 세계질서에선 이룰 수 없는 국가의 영광과 위대함의 부활을 위해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길 바라고 있다. 그에 발맞춰 각지에서 민족주의와 부족주의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원사 역할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하다. 막중한 도덕적·물질적 책임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다. 미국의 쇠락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안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과연 세계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난무하는 거친 정글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잘 다듬어진 정원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정원과 밀림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뜻밖의 계엄령 때문에"…전국민 수면 부족 주의보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6335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