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9세 '헌혈 정년' 맞고는 영정사진 봉사로 나눔 이어가

그런데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병구(71) 씨는 생애 첫 헌혈에 참여했던 1971년 9월 30일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 시절 몸에서 뽑아낸 피는 최후의 생존 수단이었다.
한 끼니가 절박한 이들이 건강을 볼모로 잡고 혈액을 팔았다.
대가 없이 피를 나눈다는 생각 자체가 생경한 시절이었다.
까까머리 고교생이던 김씨에게 '생명을 구한다'는 말은 울림을 남겼다.
그렇게 시작한 헌혈은 49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횟수로는 401회에 달했다.
매해 여덟 차례씩 헌혈한 셈이다.
전혈 44회, 혈소판 66회, 혈장 291회 등 김씨의 실천은 큰 기록을 썼다.
그는 이달 2일 세계기록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WRC)에 세계 최장기간 정기 헌혈자로 등재됐다.

"건강하니까 헌혈할 수 있었고, 헌혈하니까 건강할 수 있었죠."
김씨는 깨끗한 피를 나누기 위해 평생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술은 분위기를 즐기되 부족하게 마셨다.
음식은 약간 모자라다 싶은 정도에 그치며 최적의 몸 상태를 지켰다.
김씨는 "헌혈이 일상의 '엔도르핀'이었다"고 말했다.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1977년 김씨는 주말이면 전남 벌교에서 헌혈소가 있는 광주까지 길을 나섰다.
때로는 벌교전화국까지 헌혈 버스가 달려오도록 요청했다.
그 덕분에 직장 동료가 다 함께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연인에게 바칠 혈서를 써야 한다며 한 대롱만 뽑아달라던 청년, 퇴직을 맞아 정든 일터를 떠나는 헌혈의 집 간호사 등 웃고 울었던 기억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수북이 쌓였다.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2016년 300회를 달성했던 날이다.
정작 자신은 몇 번째인 줄도 몰랐던 헌혈을 마치자 간호사들이 촛불 3개를 밝힌 케이크를 들고 왔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상심에 잠긴 때도 있었다.
헌혈의 '정년'을 맞았던 지난해 봄이다.
혈액관리법은 헌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6세부터 69세까지로 규정한다.
김씨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 혈액검사 결과지를 제출했으나 예외는 없었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한 그는 경험과 지식을 살려 나눔의 삶을 이어가기로 했다.
장성에 사는 김씨는 가까운 광주와 전남의 복지시설, 요양원 등을 찾아다니며 영정사진 촬영 봉사를 실천 중이다.
김씨는 "제가 믿는 불교에서는 나눔과 보시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찾도록 가르쳐요.
헌혈 덕분에 자부심과 긍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라고 11일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국 탓에 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헌혈은 건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며 "한 번쯤 도전해보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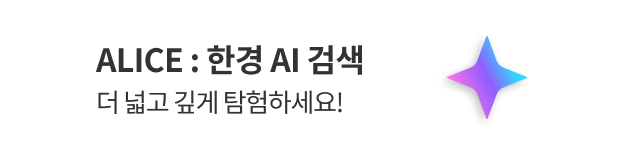

![[속보]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2.2257924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