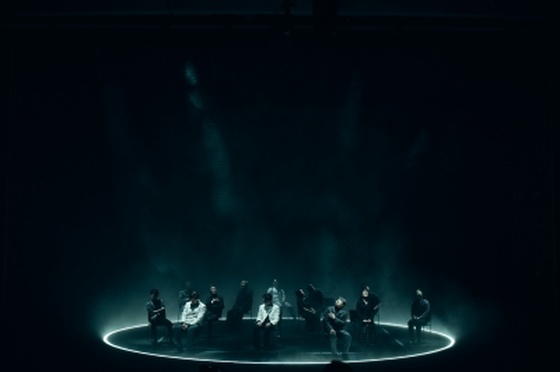대출금리 개입 어렵다면서…카드 수수료는 통제하는 정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인혁 금융부 기자

15일 오후 금융위 앞에서 열린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김준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본부장이 이렇게 말하자 집회 참여자 400여 명 사이에서 쓴웃음이 나왔다. 김 본부장 발언의 진위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카드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감안할 때 충분히 있음 직한 에피소드로 보인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적격비용을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제도다. 즉 정부가 카드사에 ‘적정 마진’을 정해주는 것이다. 해외에선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계약을 통해 수수료율이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수수료 상한선 규제를 두는 일부 사례가 있지만 국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물론 이유 없는 규제는 없다. 이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가맹점주가 손님들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가 시행되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카드사에 비해 ‘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대폭 내려갔고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출현으로 카드사의 ‘횡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신용판매라는 핵심 수익원이 쪼그라들면서 카드사의 환경은 악화됐다. 12년 동안 카드 모집인이 10만 명에서 8500명으로 줄고 카드 영업점의 40%가 없어졌다. 자영업자에게 카드 수수료는 더 이상 큰 부담이 아니다. 2007년엔 영세가맹점도 4.5%의 수수료를 냈다. 현재는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가맹점으로 분류돼 0.8~1.6%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있다. 카드사로선 1.5%는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 증가 등으로 올해 역대급 수익을 거두고 있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수익이 조금 줄었다고 거리로 나와 총파업 운운하는 데 대한 고까운 시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규제로 내년도 카드론 수익이 곤두박질칠 것이란 점은 차치하더라도, 적격비용 제도가 가맹점주와 소비자 효용도 감소시킨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해 혜택이 좋은 ‘혜자카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단말기나 영수증 출력을 위한 감열지 무상 제공 등 카드사들이 가맹점주에 제공하던 혜택도 자취를 감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급등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 업계에선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얻기 위해 수수료가 재차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퓰리즘 속에 가맹점과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가로막히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