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옮겨붙은 인력 쟁탈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학력·전공 무관, 3~5년 5000만원
연봉 오른 IT개발자와 다른 직종
기업 디지털 전환에 몸값 뛰어
연봉 오른 IT개발자와 다른 직종
기업 디지털 전환에 몸값 뛰어
국내 한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 인사담당자는 최근 클라우드 엔지니어 경력 채용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사업부에서 “꼭 채용해 달라”고 강조한 인력의 몸값이 예상보다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해당 관계자는 “전문고 출신의 경력 5년 차 인물이 6000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요구했다”며 “협상이 안 돼 채용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뛰고 있다.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3~5년만 해도 5000만원, 고급 인력은 1억원도 받는다”는 말이 업계에 번지고 있다. 클라우드서비스업체(CSP), 클라우드 관리업체(MSP) 등 전통 업체들이 몸집을 키우는 가운데 SI·보안·플랫폼업계까지 웃돈을 주고 인력 쟁탈전에 참여하고 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최근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연봉 인상 릴레이에서 부각된 ‘개발자’와는 다른 직종이다. 모두 운영체제(OS)나 네트워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물리적인 서버 관리가 우선이다. 각기 다른 CSP 업체들의 클라우드 구축 경험이 필요하고 운영 및 장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도 있어야 한다.
국내 산업계에 클라우드 개념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0년대 초다. 당시 상당수 기업은 보안과 비용 등 이유로 클라우드 도입을 꺼렸다. 자연히 업계의 인력 풀은 좁아지고, 처우는 박해졌다. 전공 유무를 따지지 않는 풍토도 이때 자리했다.
반전의 계기는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왔다.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T)이 빨라지며 재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IT 전문 헤드헌팅 업체 A사 임원은 “연봉 3800만원을 받던 4년차 대졸 인력이 5800만원을 받고 이직하는 등 올해 특히 몸값이 뛰고 있다”며 “포트폴리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0~30% 정도 연봉이 올랐다”고 귀띔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MVP 인증’ 등 CSP 업체들의 자격증을 겸비한 10년차 상당은 최고 대우를 받으며 옮겨간다. 연봉은 대략 1억원 전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추세는 일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클라우드 서비스 동향이 인프라 관리에서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IT업체 관계자는 “SaaS 서비스에선 프로그래밍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엔지니어보다 개발자들이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뛰고 있다.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3~5년만 해도 5000만원, 고급 인력은 1억원도 받는다”는 말이 업계에 번지고 있다. 클라우드서비스업체(CSP), 클라우드 관리업체(MSP) 등 전통 업체들이 몸집을 키우는 가운데 SI·보안·플랫폼업계까지 웃돈을 주고 인력 쟁탈전에 참여하고 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최근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연봉 인상 릴레이에서 부각된 ‘개발자’와는 다른 직종이다. 모두 운영체제(OS)나 네트워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물리적인 서버 관리가 우선이다. 각기 다른 CSP 업체들의 클라우드 구축 경험이 필요하고 운영 및 장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도 있어야 한다.
국내 산업계에 클라우드 개념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0년대 초다. 당시 상당수 기업은 보안과 비용 등 이유로 클라우드 도입을 꺼렸다. 자연히 업계의 인력 풀은 좁아지고, 처우는 박해졌다. 전공 유무를 따지지 않는 풍토도 이때 자리했다.
반전의 계기는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왔다.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T)이 빨라지며 재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IT 전문 헤드헌팅 업체 A사 임원은 “연봉 3800만원을 받던 4년차 대졸 인력이 5800만원을 받고 이직하는 등 올해 특히 몸값이 뛰고 있다”며 “포트폴리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0~30% 정도 연봉이 올랐다”고 귀띔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MVP 인증’ 등 CSP 업체들의 자격증을 겸비한 10년차 상당은 최고 대우를 받으며 옮겨간다. 연봉은 대략 1억원 전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추세는 일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클라우드 서비스 동향이 인프라 관리에서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IT업체 관계자는 “SaaS 서비스에선 프로그래밍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엔지니어보다 개발자들이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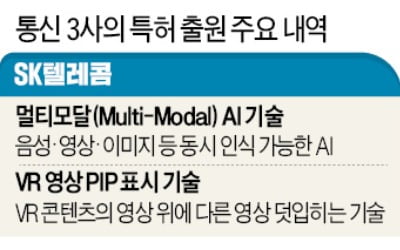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