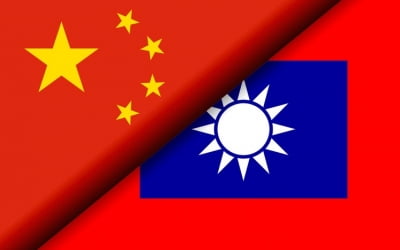中 대사, 김치·한복 종주국 논란에 "내 것, 네 것 하지 말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중 수천 년간 붙어 살아, 그 과정에서 서로 영향"
자국 내 역사왜곡 움직임 사실상 옹호
자국 내 역사왜곡 움직임 사실상 옹호

싱 대사는 26일 MBC '이슈 완전정복'에 출연해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나 한복도 우리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김치와 한복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둔갑시킨 자국 내 움직임을 사실상 옹호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싱 대사는 "한중 양국은 수천 년간 붙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줬다. 유교사상은 서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것(종주국 논란)을 양국 국민이 서로 감정을 좋게 하는 유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일부는 오해인 듯하고 일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대사관도 노력하겠지만 국민들이 조금 마음을 따뜻하게 포용을 크게 하면서 이것은 유대라고 하면 좋겠다"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했다.
싱 대사는 또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남중국해·쿼드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직접적으로 '중국'이 적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측이) 많이 노력한다고 저도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대만 언급 등이)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좀 아쉽다는 뜻"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도 코로나도 계속 안정돼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며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이 좀 없다"고 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의 김치와 한복 등을 자국의 고유문화라고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조선시대 한복을 중국 명나라 때 입던 '한푸'라고 우기거나, 김치가 중국식 채소절임인 '파오차이'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