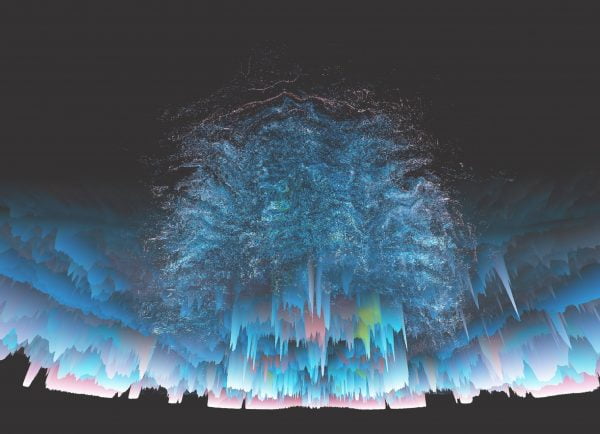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기보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생각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사람은 혼자가 아닌 주위 환경(環境) 등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은 빗나가기 마련이다. 가끔 의기가 투합(投合) 되어 동업(同業)을 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서로 간의 주어진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운(官運)의 흐름에 온 동업자와 손운(孫運)의 흐름에 온 동업자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이럴 때는 평소 상대방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 사이는 멀어지고 만다. 부부(夫婦) 간에도 예외는 아니다. 서로 간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느끼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감정의 다름이 바로 갈등(葛藤)이다.
의사 부인인 여인과 직업이 의사인 여인의 경우 가정(家庭)에서 남편의 존재가치는 어디가 더 높을까? 당연히 의사 부인 여인의 가정이다. 예를 들면 직업이 의사인 여인들의 명국(命局)은 공통적으로 남편의 가치를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명리(命理)로 해석(解釋) 하면 여인의 명국에서 자기 자식(孫)이 자신의 남편(官)을 극(剋)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이러한 의미가 중요하지 않지만 예로부터 이러한 여인의 명국은 팔자(八字)가 세(强)다고 하였다. 결국 남편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는 여인의 가정에서는 비단 현재뿐만 아니라 말년(末年)에도 남편 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자신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설(定說)이 된다. 의사 부인과 여의사를 예로 들었지만 스스로가 남편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 여인들은 실제로도 남편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다. 당연 남편 복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니 복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복을 준비(準備) 해야만 한다.
50대 중반의 여인이다. 명국(命局)을 살펴보니 그 간의 삶 속에서 두 번의 큰 굴곡이 있었다. 첫 번째는 40대 중반의 귀(鬼) 운 이었다. 나름 열심히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남편이 하는 일에 투자(投資)를 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은 빚만 잔뜩 떠안고 결국 이혼(離婚)을 하고 말았다. 두 번째는 타인(他人) 운의 흐름이었다. 부모(父)나 자식(遜) 덕(德)은 보았어도 타인(兄) 덕을 보았다는 말은 들어보기가 어렵다. 타인에게 복을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이러한 타인운의 시기에는 종종 인패재패(人敗財敗)에 관한 일이 발생한다. 사람 잃고 돈도 잃는다는 뜻이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자에게 거금을 투자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된다.
두 번의 상처는 여인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하였다. 일지(日支)의 생문(生門)만이 여인의 삶을 기꺼이 이끌어 주고 있을 뿐 그 생문(生門)이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지는 않는다. 푸념 어린 말투에서 비관(悲觀) 한 삶의 모습이 그려진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希望)이 없는 것 같네요!”
“저에게도 미래(未來)라는 것이 있을까요?”
…….
명리(命理)상 장사와 사업(事業)의 차이는 무엇일까? 장사는 손(孫)과 재(財)를 활용(活用)하는 일이요 사업(事業)과 투자(投資)는 관(官)과 부(父)를 활용하는 일이다. 부(父) 자리는 인덕(人德)의 자리요 권리(權利)의 자리이다. 여인의 명국에서는 아쉽게도 부(父)라는 자리가 없었으니 지난 삶 속에서 두 번의 큰 굴곡은 모두 이로 인한 까닭이다.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며 지금까지 펼쳐진 자신의 인생 명국(命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앞으로의 흐름을 활용할 차례이다. 자신의 미래(未來)를 예측(豫測)하는 최선(最善)의 방법(方法)은 스스로가 미래를 창조(創造)하는 것이다.
여동재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