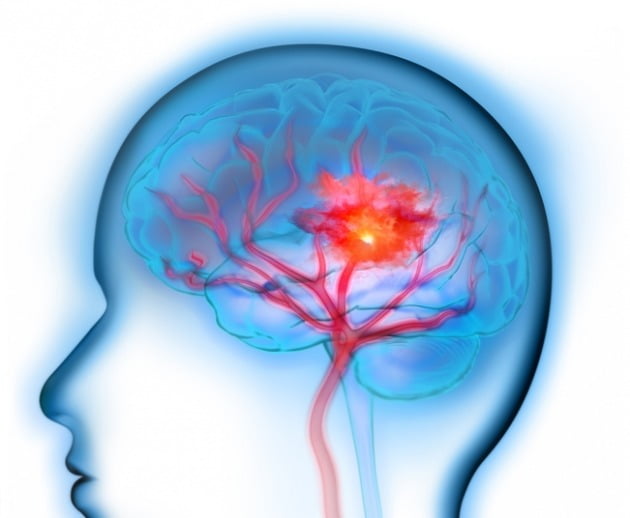게다가 이들은 CFO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다. 기업의 살림을 책임지는 CFO는 숨겨야할 것들이 많다. 여간해선 외부인에게 속내를 잘 터놓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 즉 기업의 약점과 위험 요인을 상장 주관 증권사에 털어놓아야 한다.
그러니 IB 뱅커들이 CFO 개개인의 특징과 업무 스타일, 기업 문화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선수'들끼리는 특정 기업 CFO를 다루는 '꿀팁'이나 주의해야 하는 '블랙리스트'를 공유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들이 함께 일하기 싫은 최악의 CFO로 꼽은 사례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① 종처럼 부려먹는 CFO
A그룹 CFO는 국내 주요 증권사들에게 5~6개의 비상장 계열사 리스트를 나눠주고 숙제를 내줬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는 얼마인지, 지금 당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상장한다면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등을 분석해오라는 것이다. 이 정도는 기업들이 증권사들에게 주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게 아니었다. A그룹은 해당 계열사의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짜오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렌털 사업과 중고차 판매로 수익을 내는 회사는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우니 미래 성장동력이 될 만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식이다. 컨설팅 회사에 맡겨야할 업무를 증권사에게 맡겼으니 IB 뱅커들은 황당했다는 후문이다.
이 그룹은 계열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시켰다. 이 회사 CFO는 사전에 약속을 잡지도 않고 갑자기 전화해 본사로 들어오라고 지시까지 했다. 증권사 IPO 담당자들은 잠재 고객이 될 A그룹의 눈치를 보며 과욋일을 해야 했다. IB의 업무는 상장 절차와 업무에 한정되지만, 주관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IB업계 관계자는 "컨설팅 업체는 시간당 수당을 받지만 증권사는 최종 상장이 마무리된 후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봉사나 다름없다"며 "A그룹이 깐깐하기로 유명하지만 CFO들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② '동거'만 하겠다는 CFO
B그룹 출신인 C사 CFO는 상장 주관 계약을 최대한 미루는 것으로 악명 높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6조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르면 발행회사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주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비심사 청구 준비 작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은 1년 전 주관 계약을 맺고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 상장을 서둘러야하는 이유가 있을 때도 6개월 전에는 주관사를 선정하는 게 업계의 관례다.
그런데 C사 CFO는 주관사를 선정해놓고서도 계약 이야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말을 돌렸다. 어짜피 수임료는 상장 후 정산하는데 미리 계약서를 쓸 이유가 있냐고 핑계를 댔다. 알고보니 그는 다른 그룹에서 다른 기업의 상장 추진했을 때도 예비심사청구가 임박해서야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 IB 뱅커들의 속을 답답하게 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 공식적인 계약을 맺지 않으면 C사는 언제든 자유롭게 다른 증권사로 주관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주관 계약을 맺으면 발행회사는 주식인수 의뢰서 사본, 대표주관 계약서 사본,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관사를 변경할 때도 협회에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진다.
C사의 상장 주관사는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회사 CFO는 이점을 노렸다. 여러 기업들의 상장 업무를 맡는 증권사가 C사에 충성을 다하게 만드려는 것이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하면서 '넌 나만 바라봐'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업계에서 나온다.
모 증권사의 IPO 담당자는 "주관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CFO와 일을 할 때는 윗선에 업무 보고할 때도 난감하고 지친다"고 말했다. 2편에 계속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한경 CFO Insight] 코로나 시대 최대 과제는 '인력관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3930745.3.jpg)
![[한경 CFO Insight] 특별기고-위기의 시대, CFO의 역할](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227876.3.jpg)
![[한경 CFO Insight] '통합신용도' 1위는 SK그룹](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23227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