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월급 모아 클럽 산다…골프 덕후들의 로망 간·지·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Cover Story
럭셔리 골프 클럽의 세계
럭셔리 골프 클럽의 세계

예컨대 타이틀리스트와 캘러웨이는 알지만 조디아(Zodia), 장밥(Jean Baptist)은 모르는 경우다. 전자가 ‘에버리지 골퍼’의 세계라면, 후자는 ‘골프 덕후’의 세계다. 퍼터 하나를 구하기 위해 밤사이 대한해협을 건너고, 아파트 한 채 값을 털어 골프세트를 사들이는 이들이 ‘그들만의 세계’에 빠진 골프 덕후들이다. 앤티크 마니아인 이인세 골프 칼럼리스트는 “퍼시몬(감나무) 드라이버를 휘두르면 200년 전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특별한 감정을 체험한다”고 했다.

세트 하나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럭셔리 클럽은 수제 맞춤클럽이 대다수다. 덕후들은 클럽 헤드는 물론, 샤프트, 그립, 심지어 페럴(ferrule·헤드와 샤프트를 잇는 플라스틱 부분)까지 골라 끼우는 ‘풀 커스터마이즈’를 선호한다.
프리미엄 브랜드 클럽 편집숍인 판교골프피팅 관계자는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한 세트에 수십만원 하는 보급형 골프채를 선호하고, 연봉 수천만원인 회사원이지만 1000만원짜리 아이언에 꽂히는 게 골프용품 시장의 아이러니”라며 “소비자들은 단순히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클럽을 만드는 소재와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 등 지갑을 여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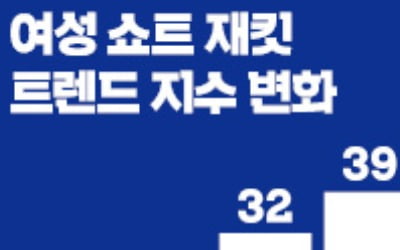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