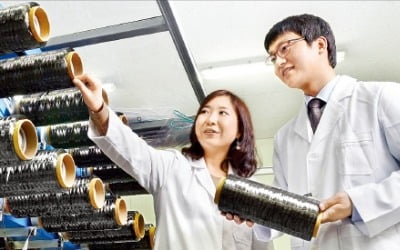작년 메이저 포함 2승 수확
상금 9억1276만원 벌었지만
손에 쥔 타이틀없어 마음고생

그는 투어에서 ‘가성비’가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이다. 선수들이 대개 30개 가까운 대회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이다연은 지난해 21개 대회에 출전했다. 9억1276만원의 상금을 기록해 대회당 4346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27개 대회에 출전한 최혜진(21)이나 26개 대회에 나선 장하나(28)만큼 대회 수를 늘렸다면 상금 경쟁 판도는 달라질 수 있었다. 몸이 일찍 풀렸다면 상금왕도 불가능하지 않았다. 이다연은 “올해는 참가 대회 수를 조금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도 손에 쥔 타이틀이 없는 게 이다연을 채찍질했다. 그는 지난해 메이저대회 한국여자오픈을 포함해 우승 두 번을 기록하면서 상금만 9억1276만원을 벌었다. 처음으로 다승을 달성했고 돈도 많이 번 시즌이었지만 연말 시상식에선 ‘특별상’을 받는 데 그쳤다.
그는 “특히 시즌 초반이 아쉬웠다”고 했다. 스윙을 교정하면서 성적을 내지 못했고 주특기인 장타를 잃은 게 발목을 잡았다. 이다연은 남자들과 경쟁하며 장타 메커니즘을 익힌 선수다. 키 157㎝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타는 이다연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세게 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생각한 것이 패착이었다. 250야드를 거뜬히 넘기던 평균 드라이브 거리가 230야드로 줄었다. 이다연은 “당시 굳이 강하게 쳐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하지만 하반기에 메이저 등 전장이 긴 대회가 많다 보니 다시 세게 치게 됐고 자연스럽게 성적도 좋아졌다”고 했다.
“나만의 무기 찾아 돌아올래요”
이다연은 상금왕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뗐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020시즌 개막전 효성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시작과 함께 상금 1억4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다연은 “개막전이지만 연말에 열려 시즌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임했다”며 “그 덕분에 2020시즌을 훨씬 여유롭게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겨우내 샷의 질을 더 높이는 게 그의 목표다. 이다연은 “정상급 선수들은 드로든 페이드든 마음대로 구사한다”며 “(장)하나 언니 등 정상급 선수 몇 명만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엔 내 몸에 맞는 것, 그런 기술들을 꼭 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 이다연의 원포인트 레슨
"팔을 최대한 몸에서 멀리 빼야 멀리 치죠"
이다연의 장타 비결은 ‘있는 힘껏 치는 것’이다. 빠른 스윙 스피드를 버텨내기 위해 하체를 이용한다. 멀리 칠수록 발과 발 사이 간격을 늘린다. 이다연은 “스탠스로 거리를 조절한다”며 “멀리 칠수록 스탠스가 점점 더 넓어지는 편이다. 두 발이 어깨에서 한 발씩 벗어나는 정도로 선다”고 설명했다.
스윙을 하기 위한 두 발의 위치를 일컫는 스탠스는 골프에서 항상 토론 주제다. 이다연은 “나의 경우 넓게 서면 확실히 하체에 안정감이 생긴다”며 “장타를 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넓게 선다”고 했다. 또 “반대로 정확한 샷을 하려면 스탠스를 좁힌다”고도 했다.
이다연이 전한 또 하나의 ‘장타 팁’은 ‘테이크 백’ 동작이다. 이다연은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멀리 최대한 쭉 당긴다는 느낌으로 클럽을 들어야 한다”며 “팔을 최대한 몸에서 멀리 빼며 ‘백 스윙’을 하면 ‘오버 스윙’ 동작도 방지된다”고 전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