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 인생살이, 껍질 벗기듯 파고들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성희 장편소설 '상냥한 사람' 출간

소설은 인기 드라마 ‘형구네 고물상’에서 아역 배우 ‘진구’를 맡았던 형민의 어린 시절에서 시작한다. 큰 인기를 누렸지만 본명 대신 ‘진구’로만 불리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형민은 어릴 때 이미지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아역 배우를 발판으로 연기하고 싶었지만 오디션에 낙방하고, 회사원이 된 그는 딸을 낳고 가족을 이룬다. 하지만 삶이 순탄치 않다.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난다. 38년이 흘러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형민은 잊고 살았던 ‘진구의 삶을 다시금 기억 속에서 소환한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그의 마음엔 불행했던 과거 기억들이 떠오르고, 변명 같은 대답을 반복하던 형민은 녹화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의 슬픔을 견딜 수 있는지 소설을 쓰는 동안 거듭 물었다”고 말했다. 각각 크고 작은 사연 속에서 작가는 “삶은 누구나 그 크기와 강도가 다르지만 작은 행복과 실패가 반복되고 또 기쁨과 슬픔이 섞인 것”임을 보여준다. 소설 마지막에서 형민은 어정쩡했고 뭔가 실패한 것만 같은 지금을 되돌아보며 기억에서 지웠던, 어린 시절 진구로서 살았던 첫 번째 삶을 그리워한다. 작가가 주머니 속에 수년 동안 담아뒀다 용기를 내 꺼냈다는 이야기들은 독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묻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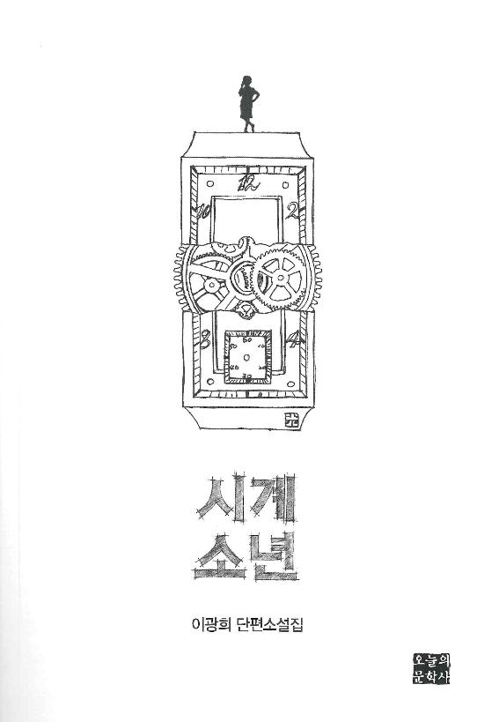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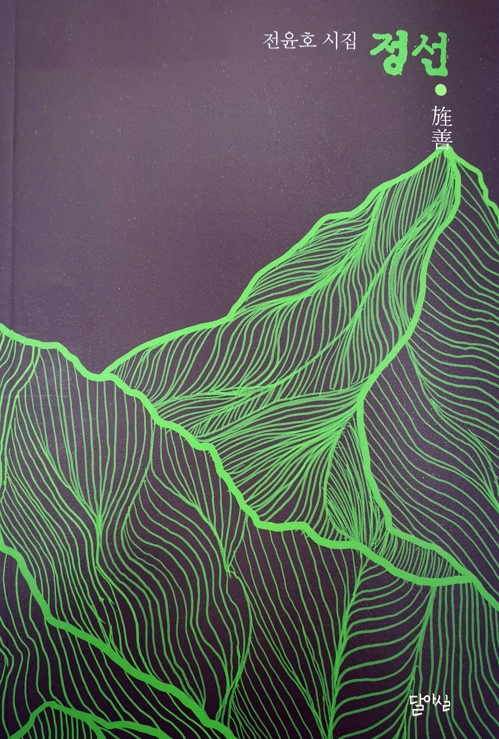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