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흥식 고려대 의대 교수의 ‘생물학적 인간’이란 강의에서 나온 질문들이다. 강의는 과학적으로 들여다본 인간의 모습을 주제로 했다. 따분할 것 같은 과학이야기 같지만 학내 우수 강의상인 ‘석탑 강의상’을 18번이나 받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그 비결은 뇌의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나 교수가 과학에 인문학을 접목해 흥미롭게 풀어낸 ‘스토리텔링’ 덕분이었다.
나 교수가 최근 펴낸 《What am I》는 과학적으로 들여다본 인간의 모습과 생물학적 인간이 가진 능력을 이야기한 강의 내용을 정리한 교양서다. 저자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굳게 닫힌 뇌를 여는 자물쇠”라며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시키는 잠재력을 믿고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범람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방구석 휴지조각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인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동양의 침술에서 나타나는 진통 작용이 사실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 분비에 의한 것임을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하듯 술술 풀어낸다. 유인원에게는 없는 인간의 눈 속 흰자위는 생물학적 특징일뿐더러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고차원으로 끌어올려 인간 고유의 교감능력과 협동심을 갖게 하는 도구라고 분석한다.
인간의 모든 장기가 상황에 맞게 좀 더 필요로 하는 장기에 혈류를 양보하는 순환과정에 대해선 ‘여백의 미’를 즐기는 동양의 문화관과 연결시켜 보기도 한다. 그 속에서 신체가 공존을 위해 스스로 보여주는 배려의 미덕이 결국 인간 문화 속에 발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모든 학문은 인간에서 시작해 인간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한다. 책은 ‘생물학적 인간’의 특성들을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나’를 비롯해 생물과 지구 환경에 대한 사고를 다양한 학문으로 확장하게 해준다. (나흥식 지음, 이와우, 256쪽, 1만4000원)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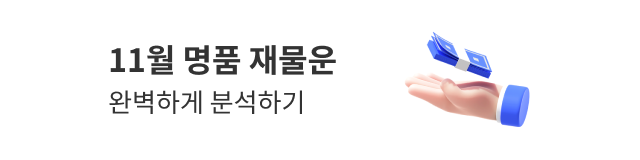
![[책꽂이] 영업의 신 100법칙 등](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17709.3.jpg)
![[책마을] 인간과 아름다운 동행…미생물의 본질은 '생명의 시작'](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16259.3.jpg)
![[책마을] 혼잡한 도로·치솟는 기름값…철도 '제2의 전성기' 온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16261.3.jpg)


![[단독]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10조 사업' 날린 이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92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