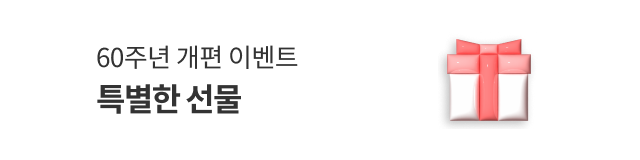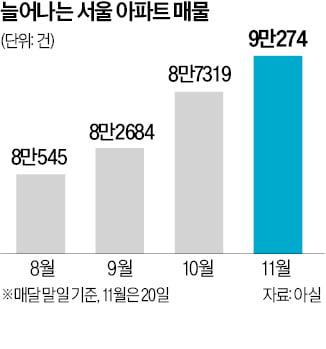현재 약값의 절반까지 '뚝'
제네릭 20개까지만 가격 보장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안을 제약사들에 통보했다. 국회 업무보고를 거쳐 제네릭 종합 대책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약가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2012년 일괄 약가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도입한 제도는 약값을 하향 평준화하는 대신 최저가를 보장해주는 방법이었다. 보험 등재 순서대로 약가가 내려가는 계단형 가격 산정 방식을 없애고 순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가격을 내린 것이다. 상위권 우등생은 손해지만 하위권 열등생은 이득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방식에 계단식 약가 제도를 접목했다. 개편안을 보면 그동안 오리지널 약가의 53.55%를 보장받았던 제네릭 가격은 30% 이하로 떨어진다. 제약사가 오리지널 약과 안전성,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을 직접 수행하고 자체 등록한 원료의약품을 이용해 직접 제조했을 때만 현행 약가인 53.55%를 받을 수 있다. 자체 제조·생동·원료의약품 등록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약가가 53.55%로 정해지고 두 가지 조건에 맞으면 43.55%, 한 가지는 33.55%, 해당 사항이 없으면 30.19%로 차등적으로 약가가 낮아진다. 또 20번째 이후 보험 약가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기존 최저가의 90%로 책정된다.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소제약사들은 사실상 일괄 약가 인하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중소제약사들은 그동안 직접 생동을 하지 않고 공동위탁 생동으로 허가를 받은 뒤 의약품수탁생산(CMO) 업체가 만든 제네릭을 판매해왔다. 자체 생동에는 2억~3억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반면 수십 개 회사가 공동 생동을 하면 수천만원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구·제조 설비에 투자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오리지널의 절반까지 약값이 보장되다 보니 제네릭 사업은 수익을 내기 쉬운 구조였다.
그러나 약가 인하에 공동위탁 생동 제도마저 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중소제약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공동위탁 생동 품목 허가 수를 제조사 1개와 위탁제조사 3개까지로 제한하고 2023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 생동으로 먹고 살았던 중소제약사들의 잔치는 끝났다”며 “자체 생동에도 비용이 드는데 약값이 오리지널의 30% 이하로 떨어지면 남는 것이 없어 다른 살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판도 변화 예고
전문가들은 제네릭 종합대책 시행을 기점으로 제약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2년 일괄 약가제 이후 국내 제약사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점에서다. 제네릭 사업 중심의 중소제약사들이 밀려나고 개량신약 등 경쟁력을 지닌 제약사들이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제네릭 개수를 줄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를 위해 중소제약사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네릭 종합 대책의 시발점이 된 발사르탄 사태는 중국산 원료에서 나온 문제인데 제네릭 판매사에 책임이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중소제약사의 성장을 막는다는 주장도 있다. 공동 생동이 폐지되는 3년 뒤 경영난이 악화된 중소제약사들이 대거 매물로 쏟아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 수는 300여 개로 이 중 연구나 생산설비를 갖춘 곳은 50여 개에 불과하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