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이름 안다고 DNA 검사 못 해"… 좌절하는 해외 입양인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국 왔지만 무연고자만 유전자 채취 가능
"미국에선 유전자 검사로 친부 찾아줘…실종아동법 개정 필요"

"경찰이 친모의 이름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안다고 했죠. 그랬더니 DNA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 법이라고 하면서요.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스티브 워커(52·한국이름 안준석) 씨는 올해로 3번째 한국을 찾았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다.
최소한 생사라도 알고 싶었다.
워커 씨는 1966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서 태어나 이듬해 입양기관에 맡겨졌다.
지난 13일 한국에 들어온 그는 친어머니의 고향인 광주, 자신이 태어난 파주, 그리고 서울까지 3곳의 경찰서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다.
사실 워커 씨가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친어머니가 그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DNA 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만 재회의 실마리가 생긴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미국에서는 DNA 검사로 미국인인 친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기에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다만 친부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워커 씨가 처음 찾아간 경찰서 두 곳에서는 장애인이 아니면 DNA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찾아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자신의 DNA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거절당했다.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된 이들이 생모, 생부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시설 퇴소증'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친부모의 인적사항이 담겨있으면 유전자 검사가 불가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 검사는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무연고 아동만 받을 수 있는데 워커 씨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연은 비단 워커 씨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세상의 빛을 본 지 1년도 채 안 돼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나 에이켈붐(48·황한미)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태어난 에이켈붐 씨 역시 최근 한국을 찾았다가 같은 이유로 경찰에서 DNA 검사를 거절당했다.
에일켈붐 씨는 "약 1년 전에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친어머니가 궁금해졌고 보고 싶어져 한국을 찾아 왔다"며 "친어머니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내 DNA를 제출할 수조차 없다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DNA 검사를 받은 입양인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번역가로 근무하는 요셉 보요브스키(33·유광식) 씨는 2016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가 경찰서에 들러 실종자 신고를 찾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았다.
미국에 돌아간 보요브스키 씨가 받은 연락은 데이터베이스에 친모와 일치하는 유전자 정보가 없다는 소식이었다.
보요브스키 씨는 낙담했지만, 혹시라도 친어머니가 자신을 찾으려고 경찰서 문을 두드렸을 때 자신의 정보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데 위로를 얻었다.
보요브스키 씨는 "실종 가족을 찾을 때만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입양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며 "입양인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입양인을 지원하는 미국 비영리 기구 미앤코리아(Me&Korea) 김민영 대표는 "입양기관이 없어졌거나, 입양인이 기억하는 친부모의 이름·나이 등 신원이 틀렸을 때는 입양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행법은 실종 가족을 찾을 때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입양인과 같이 헤어진 가족을 찾을 때도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에선 유전자 검사로 친부 찾아줘…실종아동법 개정 필요"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안다고 했죠. 그랬더니 DNA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 법이라고 하면서요.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스티브 워커(52·한국이름 안준석) 씨는 올해로 3번째 한국을 찾았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다.
최소한 생사라도 알고 싶었다.
워커 씨는 1966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서 태어나 이듬해 입양기관에 맡겨졌다.
지난 13일 한국에 들어온 그는 친어머니의 고향인 광주, 자신이 태어난 파주, 그리고 서울까지 3곳의 경찰서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다.
사실 워커 씨가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친어머니가 그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DNA 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만 재회의 실마리가 생긴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미국에서는 DNA 검사로 미국인인 친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기에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다만 친부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워커 씨가 처음 찾아간 경찰서 두 곳에서는 장애인이 아니면 DNA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찾아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자신의 DNA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거절당했다.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된 이들이 생모, 생부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시설 퇴소증'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친부모의 인적사항이 담겨있으면 유전자 검사가 불가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 검사는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무연고 아동만 받을 수 있는데 워커 씨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연은 비단 워커 씨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세상의 빛을 본 지 1년도 채 안 돼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나 에이켈붐(48·황한미)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태어난 에이켈붐 씨 역시 최근 한국을 찾았다가 같은 이유로 경찰에서 DNA 검사를 거절당했다.
에일켈붐 씨는 "약 1년 전에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친어머니가 궁금해졌고 보고 싶어져 한국을 찾아 왔다"며 "친어머니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내 DNA를 제출할 수조차 없다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DNA 검사를 받은 입양인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번역가로 근무하는 요셉 보요브스키(33·유광식) 씨는 2016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가 경찰서에 들러 실종자 신고를 찾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았다.
미국에 돌아간 보요브스키 씨가 받은 연락은 데이터베이스에 친모와 일치하는 유전자 정보가 없다는 소식이었다.
보요브스키 씨는 낙담했지만, 혹시라도 친어머니가 자신을 찾으려고 경찰서 문을 두드렸을 때 자신의 정보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데 위로를 얻었다.
보요브스키 씨는 "실종 가족을 찾을 때만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입양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며 "입양인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입양인을 지원하는 미국 비영리 기구 미앤코리아(Me&Korea) 김민영 대표는 "입양기관이 없어졌거나, 입양인이 기억하는 친부모의 이름·나이 등 신원이 틀렸을 때는 입양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행법은 실종 가족을 찾을 때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입양인과 같이 헤어진 가족을 찾을 때도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와글와글] 소개팅남 조회해보니 유흥탐정 적발…차라리 비혼할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01.1782644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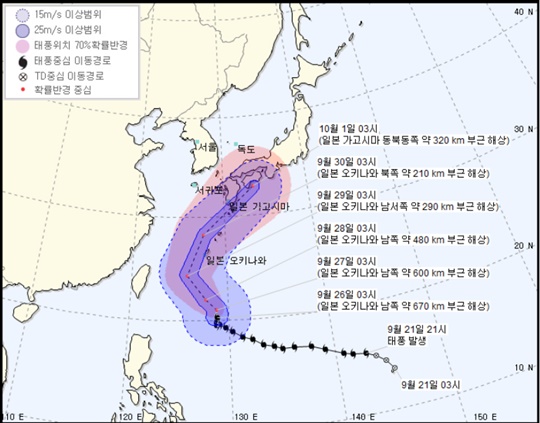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