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한달 전인데…의료계 "이대로라면 대혼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임종 기준' 등의 세부사항이 미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명의료결정법은 현재 의료기관 1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 종료된다.
오는 2월 4일부터는 전 의료기관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달 3일 기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한 환자는 약 60명 정도다.
일반인이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7천200건을 돌파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에게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임종기 전환 시점)이 여전히 불명확하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서'(의료기관용)에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임종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현재 정부는 임종 과정에 대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고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준대로라면 의사마다 환자의 임종기 시점을 천차만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암·심혈관질환·뇌 질환 등 각 질환별 임종 기준도 없는 상태라서 의사조차 연명의료를 언제 중단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을 인정했다.
다만 임종 기준은 의학회 단체에서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과장은 "임종기 판단 기준은 전문가(의사)들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임종기 기준을 마련한다면 '진료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중환자학회·암학회 등 관련 의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요청하면 언제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고 있어 전문가(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의료진 교육 및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관련한 자료를 수차례 공개해왔고, 병원별 문의가 들어오면 상세히 설명해왔다"며 "법 시행 후 초창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차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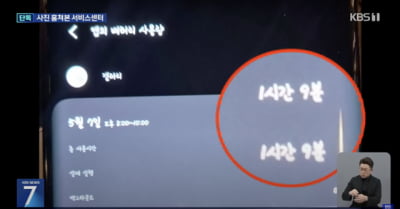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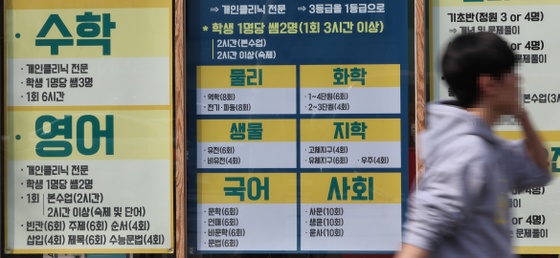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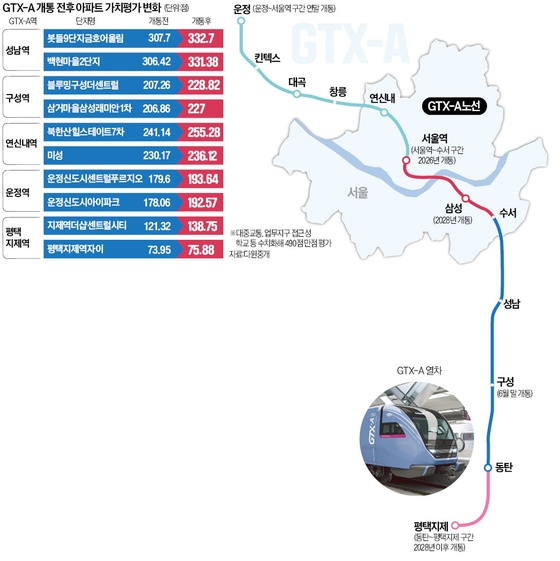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게임음악 선입견 바꾸는 RPG 콘서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259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