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 함께 책 속으로] "건축물은 시대정신 담아야… '서울로'는 그래서 아쉽다"
'22세기 건축'
![[저자와 함께 책 속으로] "건축물은 시대정신 담아야… '서울로'는 그래서 아쉽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390339.1.jpg)
《22세기 건축》(효형출판)의 저자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드러난다”며 “‘100년 후 어떤 건축이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이 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적 수명을 다하는 건축과, 영원히 살아남는 건축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송 교수는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건물의 표면과 유형, 도시 풍경과의 어우러짐(도시상상), 시간, 정신, 자연 등이 그것이다.
![[저자와 함께 책 속으로] "건축물은 시대정신 담아야… '서울로'는 그래서 아쉽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390350.1.jpg)
중국의 난징대학살기념관 역시 시대정신을 담은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1주일간 30만 명을 학살한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기념관 내부의 한쪽에서는 12초에 한 번씩 물방울이 떨어진다. 당시 일본군이 중국인 한 명을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물이 떨어질 때마다 학살된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 앞에 서면 전쟁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연과 공존하는 건물 역시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건축물 중 하나다. “흔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연이 미처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게 건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는 것처럼요. 산악의 암석 조각이 모여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스위스 발스의 온천장처럼 미(美)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100년 뒤에도 건재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얼마나 있을까. 송 교수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꼽았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근대 건물을 복원해 역사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지닌 공간입니다. 건물과 골목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걷기 좋은 마을이기도 하죠.”
그는 한국에 22세기에도 살아남을 건축물이 많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중정원을 내세운 ‘서울로 7017’ 역시 서울역과 남대문 상권을 연결하는 보행로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건물을 지을 때 최대 공간의 임대 면적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건물의 외형과 의미를 모두 고려해야 문화적 지속성을 지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게임음악 선입견 바꾸는 RPG 콘서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52592.3.jpg)

![[이 아침의 발레리노] 중력을 거스른 몸짓…발레를 해방시키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5313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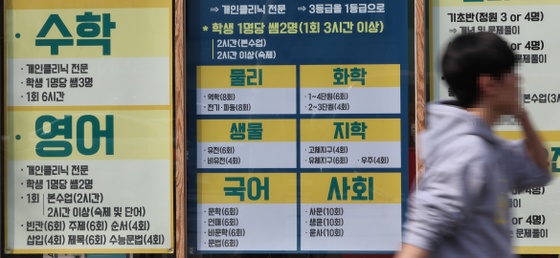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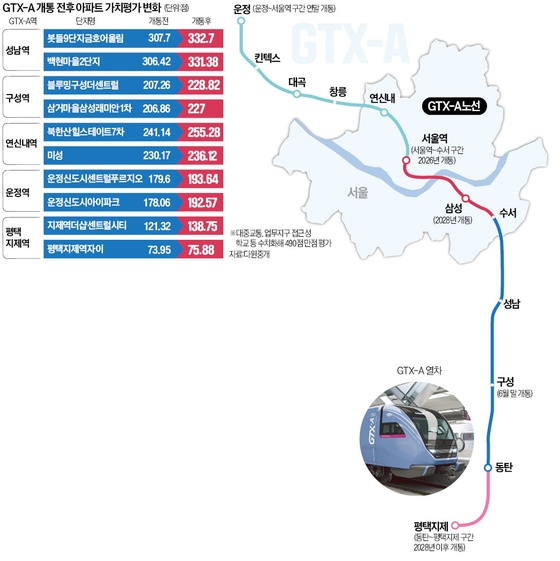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게임음악 선입견 바꾸는 RPG 콘서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259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