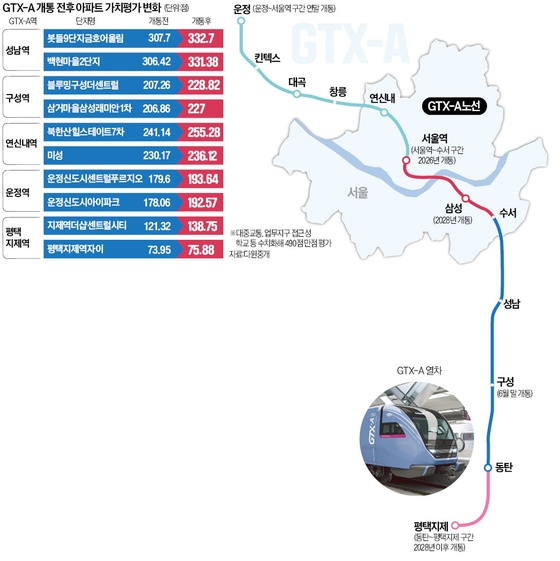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책마을] "유럽 위기의 뿌리는 유로… 회복 불씨마저 꺼뜨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 박형준 옮김 열린책들 / 552쪽 / 2만5000원
![[책마을] "유럽 위기의 뿌리는 유로… 회복 불씨마저 꺼뜨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01.15395214.1.jpg)
2007년 금융위기 직후 지속돼온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1999년 11개국으로 출발한 유로존은 지난 10년간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신작 《유로》에서 최근 유럽이 겪은 정치·경제적 위기의 원흉으로 ‘유로화’를 지목한다. 각국의 환율 정책과 재정정책 등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섣부르게 추진된 통화 통합이 유로존 위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유로존의 고정환율과 단일 이자율이다. 경제 침체에 직면한 국가가 흔히 쓰는 처방약은 크게 세 가지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조정한다. 또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재정정책을 사용해 소비를 진작시킨다. 그러나 단일통화권에 가입한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금리나 환율을 조정할 수 없다. 스티글리츠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리스(2010년), 아일랜드(2010년), 포르투갈(2011년), 스페인(2012년)이 잇따라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원인이 유로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허점투성이 유로 실험’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이 금융위기 직후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거나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강하게 부양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긴축 프로그램이 위기 국가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경기 침체에 빠진 국가에 지출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인상하라고 강요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최후 수단인 재정정책마저 빼앗았다는 것이다.
올 들어 유로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자는 “이 추세가 장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섣부른 예견”이라고 우려한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언젠가 경기침체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지만 중요한 건 경제가 회복되기 전 하강 국면이 얼마나 깊고 오래갔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책 말미에 저자는 유로존이 나아가야 할 다양한 길을 제시한다. 그중 저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 것은 이른바 ‘유연한 유로’다. 각국 화폐를 유로화로 유지하는 대신 국가별로 유로화 가치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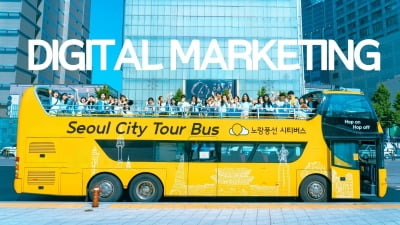

![죽다 살아난 순간에 아버지를 만나고 깨어난 '무신론 물리학자'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6059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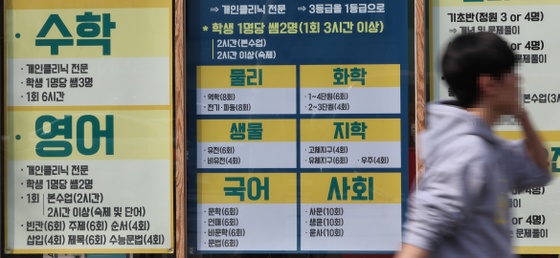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