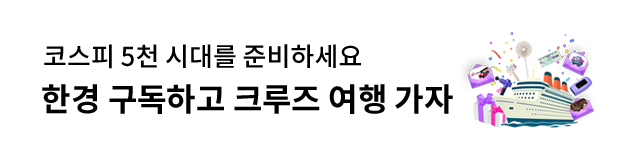박근혜 "차기 정부로" 언급에 MB 정부 말기 매각 무산된 사례 대표적
우리은행의 역사는 '외환위기 20년', 공적자금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금융권 부실이 커진 상황에 당시 상업은행·한일은행을 합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만든 게 우리은행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공적자금을 관리했다.
즉 '우리은행→예보→정부'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다가 지방은행과 증권사 등 부실 금융회사를 추가로 합쳐 우리금융지주가 됐다.
정부는 투입한 공적자금 12조8천억 원 회수를 2010년 시작했다.
그러나 7년 넘게 이어진 정부 공적자금 회수는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다.
18.5% 지분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고, 잔여지분 매각은 올해를 넘기게 됐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단숨에 팔기는 어려웠다.
이와 별개로 우리은행 지분매각은 지금껏 '외풍'에 숱하게 흔들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3번째 무산된 2012년 매각이 대표적이다.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 발언에 참여자가 없어 입찰은 무산됐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참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지 않나"고 토로했다.
두 지방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 매각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두 지방은행을 우리은행 등과 묶어 팔 계획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분할 매각으로 틀었다.
일괄 매각이 연거푸 불발되자 지방은행만 떼어 팔기로 한 것이지만, 여기엔 각 지방(경남·전남) 정치권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게 당시 중론이었다.
특히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현 BNK금융지주)가 인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한지붕 두가족'으로 재편되면서 극심한 갈등의 불씨가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과점주주 체제로 민영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최대주주다.
정권 수뇌부의 의지가 우리은행에 전달되는 경로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과거 예보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으로 해온 직접적 통제는 어렵게 됐지만, 최대 의결권을 쥔 주주로서 정부는 은행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셈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예보가 지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논란을 낳은 예보의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여 문제는 의결권 행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임추위 불참을 선언했던 예보는 최근 내부적으로 참여를 저울질하다가 비난 여론에 불참으로 급선회했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보의 임추위 참여 여부는 차기 행장 선임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는지 가늠하는 상징적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임추위는 이광구 행장이 '채용비리'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 탓에 구성됐다.
이 행장은 '박근혜 정권 사람'으로 통한다.
그는 사의 표명 며칠 전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만나 자신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행장이 먼저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 것"이라며 "찾아온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느냐. 또 말을 안 들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행장의 퇴임을 둘러싼 미심쩍은 정황이 외부의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면, 이 행장이 상업은행 출신이라는 점은 내부의 정치적 이유로 꼽힌다.
2013년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은 "제일 (인사) 청탁이 많은 게 우리금융"이라며 "당장 주인을 못 찾아주면 도덕적인 부분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행장은 이순우 전 행장에 이어 상업은행 출신이 연달아 행장이 된 사례다.
한일은행 출신 사이에선 "'이 씨 정권'에서 한일 출신 씨가 마른다"는 말이 나왔다.
상업은행 출신이 행장을 차지하면 한일은행 출신이 수석부행장을 맡는 '자리 나눠 갖기' 관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깨야 한다는 견해를 이 행장은 피력했다.
이처럼 밖에서는 정부의 오랜 관치(官治) 습성이, 안에서는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우리은행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행장 중도 하차는 어쨌거나 정부 '숙원 과제'인 우리은행 지분매각에 걸림돌로 돌아온 셈이다.
이 행장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잔여지분 매각은 중단된다고 공자위 공동위원장인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는 12일 밝혔다.
차기 행장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치권이나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우리은행 내부 개혁과 경쟁력 회복을 주도할 내부 출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은행의 한 임원은 "큰 조직에 계파가 없을 수 있겠느냐. 채널 갈등은 본질이 아니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