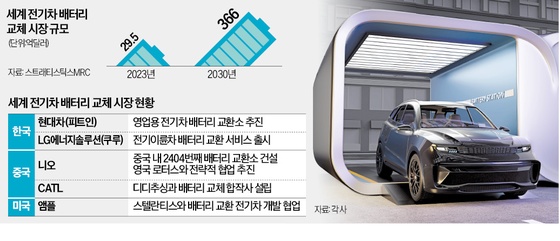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중국→인도→파키스탄' 핵도미노… 동북아서 재연될 가능성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명제는 북한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가 가까워질수록 현실감을 더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연쇄 핵무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때문에 중국-인도-파키스탄으로 이어진 핵 도미노 사례가 동북아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온다.
1964년 첫 핵실험을 한 중국이 '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자 그에 자극받은 인도는 1974년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보유로 나아갔고, 인도와 '숙적 관계'인 파키스탄은 1998년 5월말 이틀 사이에 연쇄 핵실험을 하면서 인도와 더불어 '비공인 핵클럽'에 가입했다.
중국-인도-파키스탄 세 나라가 연쇄적으로 핵보유국이 된 데는 접경국인 중국-인도, 인도-파키스탄 사이의 상호 갈등과 불신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하에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긋고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다는 기조다.
그러나 수소탄을 실은 북한 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이 답보를 계속할 경우 '최후의 저지선'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등이 언젠가 정책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을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후 견지하고 있다.
유일한 '전시(戰時) 피폭국'으로서 독자 핵무장 논의의 민감성이 강해 아직 책임 있는 인사의 발언을 통한 핵무장 및 전술핵 반입론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
원전용 핵연료 재활용을 명분으로 '핵연료 주기'(채광, 정제, 사용, 처분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를 운용하고 있어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며, 이미 수십t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미중간 갈등이 첨예해질 경우 대 중국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 또는 용인하는 핵보유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핵보유는 미국, 중국 등 기존 핵보유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견제와 저항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북한의 '핵탄두 ICBM' 개발이 미국의 '동맹국 방기'로 귀결될 가능성보다 군사 옵션을 써서라도 북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자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핵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중국 등에게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촉하는 효과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동북아 연쇄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할 경우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결국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비핵화 기조와 확장억제를 통한 억제력 유지를 강조하겠지만 북한 핵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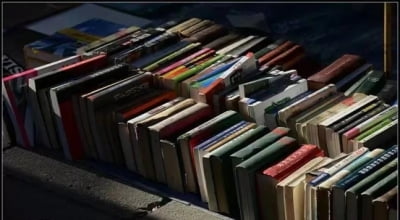


![논란의 560억 달러 결국 받는다…"자율주행 전환 큰 진전"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4072306907.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