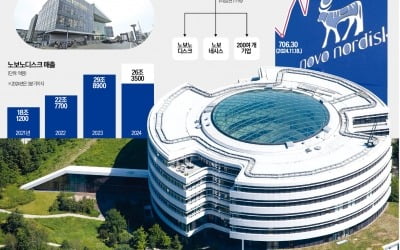어처구니 없는 보안사고 속출
자산목록서 빠진 서버로 공격, 알고보니 담당자가 안챙긴 탓
이용자 정보 개인PC서 관리도
기업들 "보안은 그저 보험"
보안담당 두는 기업 매년 줄고 그나마 다른 업무와 겸직
"사고 전까진 아무도 신경안써"

한 대형 은행 정보보안 부서에 근무하는 김 팀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내부 시스템에 오래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못 하고 있어서다. 당장 보안 패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서비스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상부 논리에 막혔다. 김 팀장은 “그나마 다른 분야에 비해 보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업계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내 기업들의 보안 수준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보유한 9586개 사업체 가운데 정보 보호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 조사 대상의 11%에 그쳤다.
◆보안담당자 권한 강화해야
보안 전문가들은 비슷한 보안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경영진의 관심과 투자 부족 때문”을 꼽았다. 한 컨설팅업체 임원은 “랜섬웨어처럼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 경영진의 관심도 집중되지만 6개월 정도면 관심이 사그라든다”며 “예산을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예산을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안담당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하지만 허울만 CISO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일을 맡고 있는 임원이 CISO 자리를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CISO를 두는 기업 비율도 매년 줄고 있다. 2014년 4.5%에서 지난해 3.1%까지 내려왔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 비용 절감을 위해 보안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재우 SK인포섹 본부장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만 취해도 해킹 사고의 70~80%를 예방할 수 있다”며 “보안담당자는 물론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보안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