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업 땐 연 수십억 벌어"
최근엔 금융조세조사부 인기…90년대 '빅2' 공안부는 시들
엘리트 많고 굵직한 사건 떠맡는 서울중앙지검은 '별 중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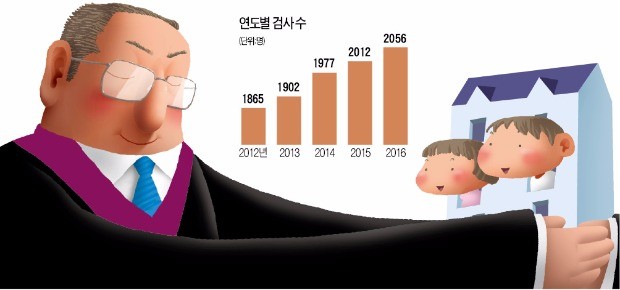
검사들이 배치받는 부서는 크게 형사부, 공안부, 특수부, 공판부, 경제·금융관련 부서로 나뉜다. 이 중 전통적으로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부서는 인지 사건(고소·고발 등이 아니라 검찰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다. ‘거악 척결’이라는 검사들의 ‘꿈’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부서라는 점에서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명실상부하게 특수수사의 핵심이 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검찰 내에서 아무나 갈 수 없는 부서로 통한다.
검사들의 특수부 선호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장래 인사에서 ‘대접’을 잘 받는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물론 특수부, 특히 ‘스케일’이 큰 사건을 주로 맡는 서울지역 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은 거의 매일 밤을 새운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최근 들어 특수부 위상을 위협하는 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 경제·금융 관련 부서다. 경제를 알지 못하면 풀어가기 힘든 사건이 늘면서 이들 부서를 거쳐 특수부로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변호사로 전업한 후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인기 요인이다. “금융조세조사부 등 경제·금융 부서 출신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수요가 엄청나다. 연 수십억원씩 벌어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형 로펌에서도 서로 모셔가기 위해 줄을 서는 게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면 1990년대까지 특수부와 양대산맥을 이뤘던 공안부(간첩·선거·노동 등 사건 담당)는 인기가 시들해진 모양새다. 기소·불기소 여부 등 사건처리 방향도 ‘윗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 내부의 전언이다.
최근 젊은 검사 사이에선 ‘특수부도 싫고 집 가까운 게 최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한다. 인지나 기획 부담이 없는 부서에서 ‘가늘고 길게’ 일하고 싶다는 검사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혀를 끌끌 차는 검찰 간부도 함께 늘었다”(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고 한다.
고향 ‘금의환향’도 꽃보직
검찰 조직은 전국에 뻗어 있다. 순환 보직이 원칙인 검사들은 어느 지역에 가게 될지 인사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구본선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 번 서울에 올라오면 계속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쥐’ ‘시골쥐’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순환 보직으로 이런 구분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근무지는 단연 서울중앙지검이다. 수사 잘하고 능력 있는 검사가 모이는 곳이고, 여기서 ‘모시던’ 상관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자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중앙지검에서 부장으로 누구를 모셨는지가 검사 생활의 큰 갈림길”이라며 “모셨던 부장이 검사장을 달면 나중에 아무래도 눈에 들어가는 거고, 별 볼 일 없는 상관을 모시면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 없이 다시 한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에서 학연보다 누구를 만나는지 등 ‘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다.
고향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다. 말 그대로 ‘금의환향’을 하면 객지에서 검사 생활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우가 달라진다고 한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부장검사는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 3~4년차 평검사가 서울지역 부장검사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다”며 “고향 유지와 변호사들이 지역 출신 평검사와 약속을 잡기 위해 줄을 서는 풍경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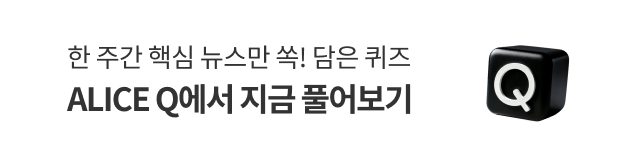


![시진핑 경주 방문 소식에…"푸바오 돌아와" 외친 푸덕이들 [APEC 2025]](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ZN.4221913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