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자로 서비스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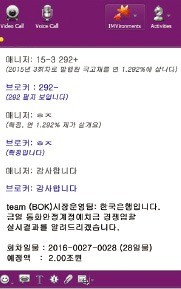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딜링 룸(자산운용실)에서 야후의 상징인 ‘노란색 웃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야후가 31일자로 기존 버전의 메신저 서비스 운영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담당 임원은 “새 버전을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와 삭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대화 내용을 회사 서버에 저장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버전을 사용하면 메신저 사용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모범 규준’을 지킬 수 없어서다.
미국 인터넷 포털 사업자인 야후가 1999년 메신저 서비스를 내놓기 전 장외 채권시장은 전화가 유일한 거래 수단이었다. 하지만 1 대 1 정보교환만 가능한 전화로는 다른 딜러(투자자)가 얼마에 거래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길이 없었다. 호가 노출을 꺼리는 금융회사들이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5분 만에 익명 계정(ID)을 만들고, 대화창에서 다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야후 메신저의 혁신적 기능은 채권시장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국내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야후 메신저를 더 이상 쓰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년 동안 단순한 거래 창구 이상의 역할을 해온 메신저에 대한 ‘애증’ 때문이다. 야후 메신저는 잦은 서비스 오류로 원망을 사기도 했지만 촌각을 다투는 거래가 끝나면 잡담을 나누고 친분을 쌓는 휴식처였다. 익명성과 불투명한 거래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채권을 거래해놓고 이를 한동안 숨기는 ‘파킹’ 거래와 금리 담합을 낳는 온상으로 지목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반사이익은 대부분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에 돌아갈 전망이다. 2010년 4월 사설 메신저의 장점에 투명성을 강화해 출시한 이 서비스는 부진한 이용 탓에 5년 넘게 부차적인 거래 수단에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8월 들어 기존 야후 거래의 90% 정도가 프리본드로 넘어오면서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남달현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장은 “대부분 시장 참여자가 야후에서 프리본드로 옮겨왔다”며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담당 임원은 “돈 한 푼 안 받고 20년 가까이 한국 채권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이끈 야후를 고마운 기억으로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탄핵 정국 속 몸살 앓는 증시…"○○○ 사라" 고수의 조언 [주간전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934760.3.jpg)

!['퇴직금 1.5억' 올인한 회사…"예금 2배 드려요" 깜짝 배당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888958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