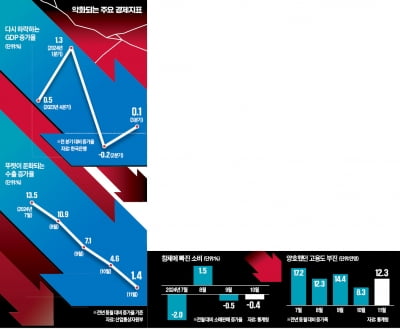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휴즈연구소(HRL)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전방 충돌 회피(FCA)’ 기능을 처음 발명했다. 당시 개발 프로젝트는 델코전자의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물리학자인 로스 D 올니 박사가 주도했다.
그러자 델코전자는 1996년 북미국제오토쇼(디트로이트모터쇼)에 전시된 다양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콘셉트카에 ‘SSC’라는 기술명으로 AEB 기능을 넣어 소개했다.
이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마케터들이 소비자 이해가 쉽도록 ‘전방경고’라는 말을 사용했다. 앞에 레이더를 부착하고, 여기서 감지된 신호를 시각과 청각, 촉각으로 전달해주는 AEB 기능이 처음 적용된 건 렉서스 SC400이며 곧바로 캐딜락 STS에도 적용됐다.
초창기에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속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충돌을 회피하는 것보다 충돌 때 충격량을 낮춰 상해율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충격 때 속도만 줄여도 사망을 부상으로, 부상은 경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AEB는 유럽과 아시아 등의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로 퍼져나갔다. 동시에 충돌 경고에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차를 멈추도록 하는 기술로 진화했다.
2000년 초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자동차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의무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고속도로보험안전협회(IIHS)가 모든 차에 자동긴급제동이 적용되면 연간 후방 추돌사고가 40%, 교통사고 발생이 20% 줄어든다는 결과를 내자 AEB 의무 적용을 확정했다.
유럽연합(EU)도 2011년 AEB가 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지난해부터 운행 거리가 긴 상용차에 우선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5만명의 부상자와 5000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부터 중대형 고급차에 적용된 AEB는 최근 다른 차종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충돌 충격이 큰 소형차나 경차일수록 AEB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전 차종으로 의무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도 의무화를 앞당긴 계기가 됐다. 당시 후방추돌 경고등 도입이 논의됐으나 보다 확실한 수단으로서 AEB로 결정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도 AEB 장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22년까지 수동변속 차종을 제외한 모든 신차에 기본 장착한다. 일부 대형차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9월까지 적용을 완료한다.
GM과 포드, FCA, 혼다,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등도 동의했다. 자동차 안전도 점차 운전자가 아니라 기계적 판단에 의존하는 시대로 변신하는 셈이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