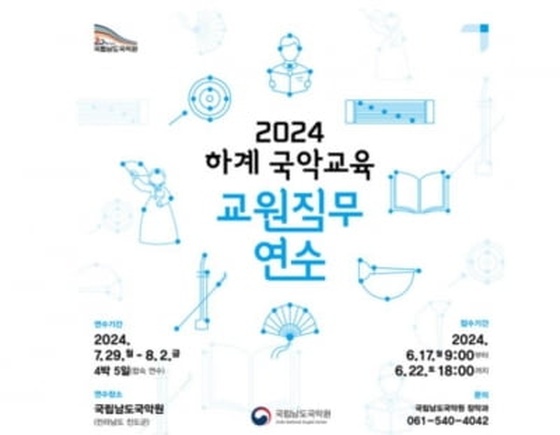일본 수출 수년간 엔저에도 침체 지속하는 이유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은 엔저 정책에도 제조업 수출이 왜 살아나지 않을까.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은 생겼으나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에 부딪혀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 침체를 우리 정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연구원(KIET)이 21일 공개한 보고서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2011년 8천20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일본 수출은 6천900억 달러로 3년 만에 15.8% 줄어들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다음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폭을 기록했다.
대지진 이후 연료 수입액이 증가했으나 주요 폼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화학, 플라스틱, 철강 등 주력 수출 업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일본 경제를 떠받드는 자동차 같은 제조업도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2002년 22.5%에서 2014년 15.8%로 7%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최근 몇년 동안 '엔저'가 주력 품목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2년 말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가 강력하게 엔저 정책을 밀어붙였으나 힘을 쓰지 못하고 최근 엔화 가치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엔화/달러 환율 가치 하락에도 수출 회복이 더딘 현상은 해외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중간재 수출을 늘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생산 비중을 높여왔다.
제조업 평균 해외 생산비중은 1990년 4.6%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약 17.2%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엔화 가치 강세로 20.6%까지 찍었다.
그럼에도 주력산업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감소하고 현지 생산수준은 하락해 수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생산비중을 확대했으나 의도한 만큼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엔저 정책으로 수출단가는 낮아졌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극심한 수요 부진을 몰고와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해외 생산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엔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있다.
KIET 관계자는 "수출주도형 경제 전략을 추진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의 수출 부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책 선택과 동향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iamle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