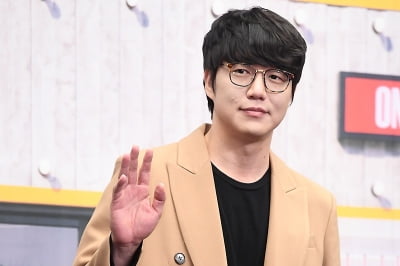"한국병에 메스 들이댄 리더십 그립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필생의 정치적 동지 겸 경쟁자로서 때론 협력하고 때론 대립하며 쌍두마차처럼 이끌었던 ‘양김(兩金) 시대’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람 잘 날 없던 파란과 곡절의 한국 현대사, 그 격랑과 격동의 소용돌이를 맨 앞에서 헤쳐나가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굵직하고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문 없는 문’의 문을 열고, ‘길 없는 길’에 길을 내며 대도(大道)와 정도(正道)를 걸었습니다. 민주화의 고지를 기필코 넘어서 정상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당신의 정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최연소(만 26세) 최다선(9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소년기부터 품었던 대통령의 꿈까지 이뤘습니다. 다섯 번의 원내대표(원내총무), 위기 시마다 맡았던 당 총재·대표 등 당신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공직을 일관했습니다.
그만큼 능력과 돌파력을 갖췄고, 당내 선후배 사이에 신망이 두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정치 역정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수감, 가택 연금, 초산 테러, 헌정 사상 유일한 국회의원직 제명, 목숨을 걸고 벌인 (23일간의) 기록적인 단식 투쟁…. 당신은 작은 이익을 탐해 큰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당 정부의 장기 집권 획책에 맞서 편한 여당을 버리고 스스로 야당의 길을 찾았습니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단연코 거부했습니다. 서슬 퍼렇던 유신정권과 신군부 독재 시대에도 옳다고 믿으면 기꺼이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신념을 대못처럼 국민의 가슴에 각인시켰습니다.
당신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뛰어들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국의 결단’으로 ‘3당 합당’을 감행,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여소야대를 한순간에 뒤집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대권)도 잡았습니다. 역사적 반전과 통 큰 결단은 당신 아니면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숱한 비판과 오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단성의 승부사였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겨보곤 합니다. 당신은 또한 “건강은 빌릴 수 없지만 머리는 빌릴 수 있다”며 ‘인사가 만사’임을 강조했습니다.
32년 군정(軍政)에 마침표를 찍고 출범시킨 최초의 문민정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꾼 전격적 금융실명제 도입, 하루 밤 사이 ‘별’ 50개를 떨어뜨린 하나회 척결,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한 역사 바로 세우기…. 당신은 개혁을 향해 거침없는 발길을 내디딘 쾌도난마의 지도자였습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악화시킨 ‘한국병(病)’의 환부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학연(경남중고서울대)을 떠나 좋은 정치적 선배였고 ‘기댈 언덕’이었습니다. 민자당 대표 시절, 준비 안 된 40대 백면서생이 하루아침에 원외지구당위원장을 맡아 삭막한 정치의 세상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를 과감히(?) 기용했습니다.
2년간의 원외 활동 후에 14대 총선(1992년)에 뛰어든 정치 신인이었던 저에게 자정 무렵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선거 운동을 독려하고 응원하시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신이 바로 세우려던 이 나라 민주주의가 아직도 흑백논리진영싸움지역감정의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부족한 후배들로 하여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선진 민주주의를 꽃피우도록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아 주소서. 우리가 애타게 염원하던 통일 조국이 멀지 않은 이때에 영면하셔서 안타까운 마음 더욱 크고 깊기만 합니다. 거산이시여, 민주화와 개혁의 횃불, 큰 산의 ‘큰 바위 얼굴’이시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수고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형오 한경 객원대기자 (전 국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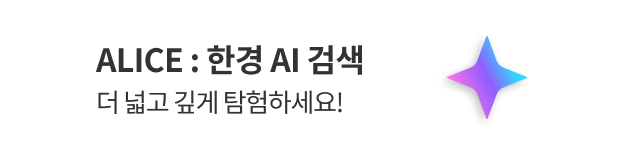

![野, '예산 감액안' 예결위서 강행 처리…與 반발 퇴장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N.38794590.3.jpg)
![[속보] 野, '예산 감액안' 예결위서 강행 처리…與 반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9450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