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해외평가 대응 실태

QS 세계대학평가는 평판도 비중이 50%나 돼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평판도 조사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분야 우수 대학을 최대 30곳까지 적도록 한다. 이때 대학명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대부분 ‘한국’보다 ‘코리아’ 영문명으로 검색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한국외대의 영문명은 검색이 잘 되도록 ‘Hankuk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로 바뀌었다.
또다른 서울 유명 사립대의 올해 보직교수 하계 워크숍에선 ‘QS 평가 졸업생 평판도 제고를 위한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방안’이 주요안건으로 올라왔다. 특정 대학평가의 세부 지표에 맞춰 전체 대학 운영방향을 정하는 셈이다.
29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이 워크숍 문건에는 ‘QS 평가와 관련해선 중국인 학생 유치가 중요한 요소’, ‘(평판도 평가) 응답자 중 상위 5개국에 대해선 국제교류 관련 부서에서 특히 신경 쓸 것’ 등의 지침이 명시됐다.
개별 학과에 대한 평가와 예산 배정에도 대학평가는 깊숙이 개입돼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 한 학과의 예산 내역을 보면 ‘연구소 발간 학술지 스코퍼스(SCOPUS) 온라인 등재 추진 비용’으로 1000만원이 책정됐다. 스코퍼스는 QS와 타임스고등교육(THE) 등 주요 세계대학평가가 연구력 지표 측정시 활용하는 논문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DB)다.

지난 15일 한국외대에서 열린 한국대학랭킹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정현식 서강대 기획처장은 QS·THE 등의 온라인 배너와 책자 광고 사례를 들어 문제제기했다. ‘아시아 대학, 특히 한국 대학은 대학평가기관의 봉인가?’란 자문이 문제제기의 핵심이었다.
정 처장이 분석한 QS 책자 광고 사례에 따르면 총 67건의 광고 가운데 아시아 대학(39건)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이 9건으로 최다였다. 말레이시아(7건) 대만(5건) 파키스탄(4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 대학들의 광고 건수가 유럽(6건)과 아메리카(1건) 전체 대학들 광고보다 많았다.

서울의 한 주요대학 관계자는 “글로벌 평가기관에 광고를 하지 않았더니 국내 대학평가에선 비슷한 순위인 다른 대학들에 뒤처진다. 광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같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실제로 한국 대학들은 최근 수년간 세계대학평가에서 순위가 크게 올랐다. QS 평가의 경우 예의주시할 기간은 2007~2012년이다. 이 5년간 국내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순위 급등세를 보였다.
대표적 사례가 성균관대다. 2007년 QS 평가 세계 380위였던 성균관대는 2012년 179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불과 5년만에 두 배 이상 껑충 뛴 것이다. 같은 기간 △포스텍(포항공대) 233위→97위 △연세대 236위→112위 △고려대 243위→137위 등도 100계단 이상 순위를 올려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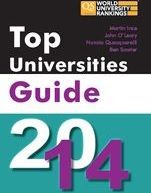
아시아, 특히 한국 대학 광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한 정현식 처장의 분석이 들어맞았다. 광고비 지출과 순위 상승의 상관관계를 짚은 그의 문제제기가 실제 사례에서도 유추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평가관계자는 “광고를 비롯한 유료 패키지 가격대가 수만달러 수준까지 올라가 부담스럽다”며 “광고와 순위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선 평가의 비중이 높은 평판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글로벌 학술정보서비스기업이 국내 대학과의 네트워킹에 나서는 것도 평가 컨설팅이나 세일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톰슨로이터는 이달 7일 서울대를 찾아 ‘좋은 대학을 넘어 탁월한 대학으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톰슨로이터 관계자는 15일 한국외대에서 열린 대학랭킹포럼에서도 발표를 맡았다. 톰슨로이터는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연구력 지표 관련 데이터를 미국 US 뉴스&월드리포트 등 주요 대학평가기관에 제공한다.
때문에 대학평가의 필요성은 수용하되 평가가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추세다.
이와 관련,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인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들이 외부 평가에 너무 휘둘린다. 평가 잘 받기 위해 따로 팀을 꾸려 준비하고 관련 자료도 용역까지 줘가며 만들고 있다”면서 “유명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수입의 절반 가량이 한국 대학들에서 나온다고 한다.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 [대학평가 이렇게 보자(상)] 연고대 제친 성대·한양대…'어떤' 대학평가를 믿습니까?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계엄령 후폭풍…방송가 "다 숨죽였다"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3.3474591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