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S 버냉키 지음 / 안세민 옮김 / 까치 / 704쪽 / 3만원

2006~2014년 미국 중앙은행 의장을 맡았던 벤 버냉키(사진)는 회고록 《행동하는 용기》에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형 투자은행과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부터 세계 중앙은행들과의 공조체제 구축, 양적 완화까지 그가 추진하고 시행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설명한다. 또 미국 중앙은행의 역사와 기능, 미국 통화정책의 역사, 케인스 경제학과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논쟁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중앙은행의 명시적인 두 가지 책무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다. 버냉키는 2006년 중앙은행 의장이 되면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통해 중앙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대공황을 연구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이론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행동노선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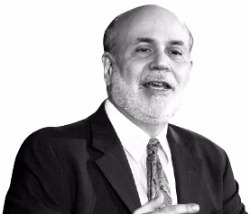
금융위기는 중앙은행이 해야 하는 임무의 중심에 ‘금융의 안정성 유지’를 두게 했다.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금융시스템의 ‘나무’와 ‘숲’ 모두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나무 수준에서는 은행에 대한 전통적 감독을 재검토하고 강화했고, 숲 수준에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에 더 주목했다.
현재 규모가 큰 금융회사들은 도드-프랭크법(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에 의해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올해 4월, 금융부문의 대부분을 몇 년에 걸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버냉키는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강화된 규제가 중요 회사들을 분할하도록 유도한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버냉키는 ‘소통’을 강조한다. ‘60분’과 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대학으로 강연을 다녔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직접 만남으로써 미국민과 중앙은행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중요시했다. “엉뚱한 생각이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이어졌고, 신중한 토의를 통해 아이디어들을 분석, 검토하고 실행했다. 모든 구성원을 아이디어 개발에 참여시키자, 그 결과로 나온 정책을 시행하는 일에 더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참여하게 됐다.”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한다. “한 세기에 한 번 올 만한 금융 재앙의 위험이 닥쳤는데도 의회 의원들은 이데올로기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2주일 이상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그는 향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스템의 강고함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허리케인이 집을 강타하면, 집 주인은 집의 구조적 결함을 탓한다. 경제를 강타하는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다.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더라도, 집의 구조가 튼튼하다면, 즉 시스템 자체가 취약하지 않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강경태 < 한국CEO연구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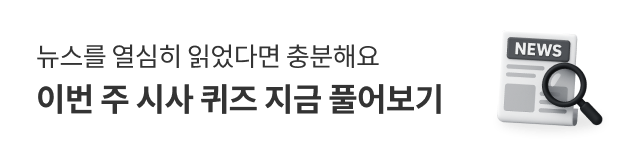
![영하 60도, 사체로 벽 쌓고 버텼다…엘리트 교수의 '미친 짓'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59486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