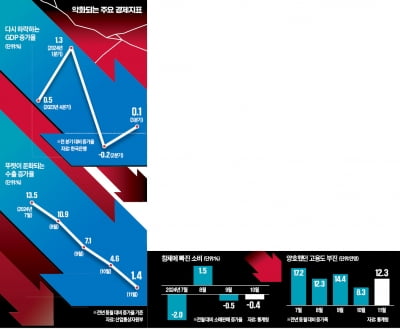귀족계급들의 취향에 맞춰 마차를 만들어주던 장인들을 이탈리아에선 카로체리아(carrozzeria)로 불렀다. 그리고 승용마차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 이후 원시적 형태의 자동차로 발전했고, 19세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등장은 본격적인 ‘최초’ 자동차 경쟁을 이끌었다.
시기적으로 어떤 회사가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지만 통상 프랑스의 파나르 르바소를 꼽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카를 벤츠가 1886년에 만든 3륜 특허차(사진)를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초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른바 ‘특허’를 최초로 냈다는 점에서 그렇다.
카를 벤츠보다 4년 늦었지만 1890년 푸조의 첫 차도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꼽힌다. 타입2(Type 2)로 알려진 푸조의 첫 차는 증기기관 대신 휘발유 엔진에 네 개의 바퀴, 그리고 다임러 엔진을 탑재했다. 길이가 2.5m에 달했고, 무게는 250㎏으로 앞뒤 좌석이 마주보도록 만들어진 4인승이었다.

르노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 오펠도 첫 차를 내놨다. 1838년생인 아담 오펠의 아들 5형제가 1899년 프리드리히 루츠만의 자동차를 개조한 1호차를 선보였다. 루츠만은 대장장이로 1895년 자동차를 개발한 인물이다. 오펠 형제는 루츠만의 판권을 사들여 자동차 부문을 설립했고, 3년 뒤 ‘오펠-루츠만’이란 자동차를 출시했다.
이처럼 ‘최초’를 강조하는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을 앞세운다. ‘최초’에서 시작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결코 바꿀 수 없어서다. 후발주자가 제 아무리 전통을 강조해도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에서 ‘최초’는 그만큼 장점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초가 반드시 완성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후발주자들은 물리적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각종 기능에 ‘최초’ 경쟁을 펼쳤다. ‘최초 HUD’ ‘최초 고장력 강판’ ‘최초 무릎 에어백’ 등 수많은 ‘최초’에 사활을 걸었고, 일부 기업은 잦은 고장에도 ‘최초’ 재미를 톡톡히 보기도 했다. 그래서 ‘최초’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자동차에서 시선을 끄는 마케팅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최초’에 살짝 발만 올린 ‘유사 최초’도 적지 않다. 이른바 ‘동급 최초’다. ‘최초’라는 말을 붙이고 싶은데 앞서 다른 곳이 먼저 적용했으니 ‘동급’만 슬쩍 붙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국산 동급 최초’까지 간다. 동급 최초까지는 애교라 하더라도 ‘국산 동급 최초’는 ‘애절함’으로 다가온다. 그만큼 절박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그들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