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5大 노무 리스크'] 대법 판결 이후에도 현장은 혼란…통상임금 소송, 3.5배 늘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황 겪는 조선·정유업계…통상임금 논의조차 못해
삼성 석유화학 계열사들은 "상여금 제외" 통 큰 합의
![[기업 발목 잡는 '5大 노무 리스크'] 대법 판결 이후에도 현장은 혼란…통상임금 소송, 3.5배 늘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411/AA.9277820.1.jpg)
르노삼성자동차는 통상임금 문제를 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하면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달 1심 법원이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회사가 항소하면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노사 관계의 핵심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도 기업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소송 급증
통상임금은 야간·주말 등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급의 수백%에 달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상당수 노조는 임·단협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줄소송을 제기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제3자의 판단에 기대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6월 말 기준 70여건이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건수가 현재 3.5배인 250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 발목 잡는 '5大 노무 리스크'] 대법 판결 이후에도 현장은 혼란…통상임금 소송, 3.5배 늘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411/AA.9279205.1.jpg)
기업들이 올해 임·단협에서 해결해아 할 통상임금 문제는 크게 과거 미지급 임금 부분과 미래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눌 수 있다. 노조 활동이 활발한 자동차업계는 대부분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 과거 임금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동차업계는 미래 임금체계에도 소송 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경우가 많다.
한국GM은 지난 5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이 회사의 과거 미지급 임금 부분은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으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르노삼성자동차도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지난달 1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한 것과 결론이 다르다”며 항소했고, 노조가 기존 합의와 다르다고 반발하면서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상조차 어려운 조선·정유업계
장기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조선과 정유업계는 제대로 된 통상임금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사측에서 통상임금 확대 제안을 했지만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그룹 계열사들과 같은 수준의 제안을 노조 측에서 거부한 상태다.
정유업계에선 가장 빨리 협상을 시작한 SK이노베이션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지난달에야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고, GS칼텍스는 아직 협상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통상임금 확대 대신 미지급분은 포기
석유화학 계열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들은 과거 미지급 부분은 청구하지 않되, 앞으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연 60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평균 1.9%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상당수 기업이 삼성과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LG전자는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5% 이상이던 임금 인상 폭을 4%대로 내렸다. SK텔레콤은 기본급을 동결했고 쌍용자동차는 기본급 인상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삼성그룹 석유화학 계열사들은 상여금을 실적에 연동하는 성과급으로 전환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과거 미지급 임금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업황 부진을 반영한 것이다.
삼성종합화학 관계자는 “공장을 4조3교대로 24시간씩 주 7일 가동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인건비가 15~20% 오르는 상황이었다”며 “사원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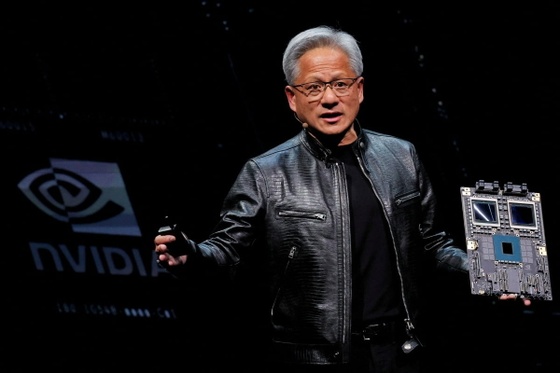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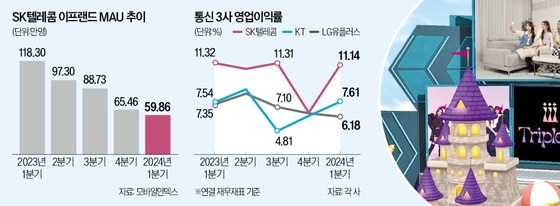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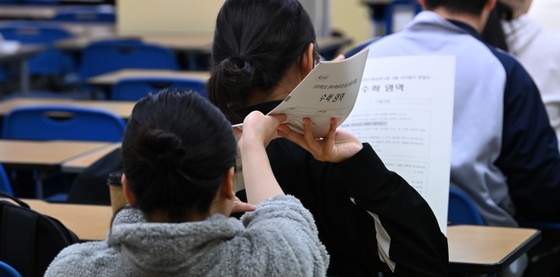


![[이 아침의 사진가] 뒤태 사진으로 170억 낙찰…초현실주의 거장, 만 레이](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8984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