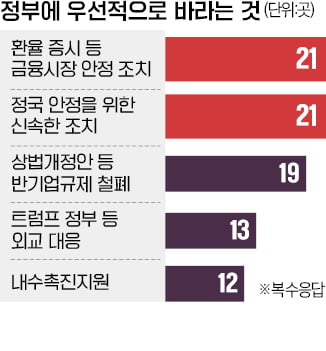1960~1970년대만 해도 법이 하나 생기면 액션이 바로 뒤따랐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가 된 형국이다. 법이 탄생할 때마다 예산, 조직, 공무원 수는 잔뜩 늘어나는데 정작 되는 일은 없다. 법이 무슨 자기복제하듯 불어나면서 그 복잡성과 상호충돌 가능성이 이미 통제범위를 벗어났는지도 모른다. 국회가 회기 내내 정쟁만 일삼다 막판에 무더기로 의사봉을 두드려대니 이런 게 제대로 체크될 리 만무하다.
혁신 죽이는 ‘법 만능주의’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법도 예외가 아니다. ‘입법 제로’라고 질타당하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하루 만에 13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상이 아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 오픈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방위 법안은 제안부터 의결까지 평균 약 423일이 걸렸다. 통상적 입법기간인 250일과 비교하면 70%가량 더 소요된 셈이다. 만약 이게 충분한 심의 때문이었다면 누가 뭐라겠나. 그동안 파행만 거듭하다 이랬으니 졸속이라고 욕을 먹는 것이다.
법을 만들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세상에 그것처럼 쉬운 일도 없다. 입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미래분야는 더욱 그렇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 섣불리 입법을 했다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혁신만 죽이기 십상이다.
미방위가 과학기술 ‘연구회 통합법’을 통과시켰지만 문제는 어떻게 통합하느냐다. 개별연구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두 개 연구회만 덜렁 합치면 ‘혁신’이니 ‘융합’이니 하는 건 말짱 도루묵이다. 성실성이 인정되면 연구에 실패해도 불이익을 일부 감면해 준다는 ‘성실실패법’ 역시 마찬가지다. 성실성 운운하며 실패 종류를 가르겠다는 이런 잣대야말로 후진적 규제라는 걸 왜 모르는지….
‘건수’ 아닌 ‘법의 질’ 따져야
정보통신도 다를 게 없다.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자 통신시장은 벌써 혼돈 국면이다. 정부는 법이 발효되면 일거에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결국 규제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끝도 없는 법의 양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금 계류 중인 무슨 ‘발전’이니 ‘진흥’이니 하는 법도 죄다 부처의 영역 확장용 아니면 정치권의 이익집단 표갈이용이라고 보면 딱 맞다.
미래분야일수록 새로운 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더라도 매번 개정이 필요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술 불확실성’ ‘시장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마당에 ‘법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야 되겠나. 그럴 바에는 미방위가 차라리 ‘입법 제로’인 게 미래 창조를 위해 훨씬 낫다. 과실련이 입법평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건수 평가가 아니라 규제 악법이나 법 같지 않은 법을 가려내는 게 핵심이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