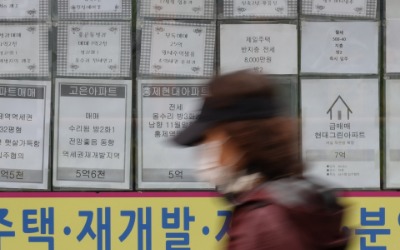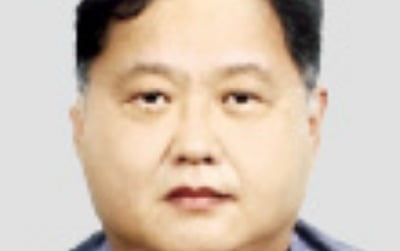창업스쿨서 가르칠 것은 기술보다 기업가 정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영학 카페
회사 가치관 앞에 겸손한 리더가
위대한 기업 일궈내
회사 가치관 앞에 겸손한 리더가
위대한 기업 일궈내

정보기술(IT) 버블이 한창이었던 1990년대에 인터넷 기반의 사업모델로 기업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기업 상장으로 큰 돈을 만지자 사업체를 넘기고 회사와 직원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전히 사업체는 유지하지만, 투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해 본업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다. 이 모두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경할 만한 리더십의 모델’의 저자 짐 콜린스는 레벨 5 리더십을 제안한 바 있다. 레벨 5 리더는 ‘겸손’과 ‘불굴의 의지’라는 공존하기 힘든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창업자들에게 불굴의 의지는 어렵지 않게 만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의식이 강한 그들에게 겸손은 소유하기 어려운 성품이다. 기업체의 사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누구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나. 고객이라고 말하면 정답이겠지만, 막상 기업이 성장하고 나면 자의식이 다시 고개를 들기 때문에 기업 리더는 고객을 가벼이 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기업가는 회사의 가치관 앞에 겸손해야 한다. 제 아무리 자의식이 강한 리더라 해도 회사의 핵심가치를 위배해서는 안된다. 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막상 가치관 앞에 겸손한 리더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 직원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조직을 만든 리더들이 추상적인 가치관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일이 어디 쉬우랴. 그래서 리더가 겸손함을 잊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고 만다.
성품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며 남의 이목 끌기를 좋아하는 자의식을 가진 리더에게도 희망은 남아있다. 리더가 회사의 가치관 앞에 ‘수단적 겸손’이라도 익히려고 노력하면 회사에 미래가 있다. 수단적 겸손이란 성품이 겸손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회사의 가치관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태도를 말한다. 성인군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리더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 기업 운영을 위해서라도 윤리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수단적 겸손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겸손의 성품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있다. 기업 경영은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많은 기업인들은 살아서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벌고도 새벽 일찍 출근한다. 그들은 일에 몰두하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할 때 돈 버는 일 자체가 재미있어서 또는 경영활동에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댄다. 기업 경영이 자아실현의 방법이라는 말이다.
궁극적으로 기업가가 추구할 모습은 수단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겸손하고 존경받을 만한 리더다. 기업 경영에 오롯이 인생을 바쳐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이룬 리더들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이리라. 그는 편안한 미국의 삶을 등지고 일제 치하의 조선으로 돌아와 유한양행을 설립했다.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 앞에서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장학재단을 세워 경제활동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가치관에 충실했다. 사망할 때는 현시가 7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도 두 자녀에게 1원도 물려주지 않았다. 평소의 지론대로 그는 유산을 모두 장학재단 등에 기증했다. 90년에 가까운 기업 역사에 한 번의 노사분규도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회사의 가치관 앞에 겸손한 리더가 어떻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한국 사회는 더 많은 혁신적 기업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창업스쿨이 더 필요하다. 창업스쿨들은 책임을 지고 창업의 기술은 물론 기업가 정신과 가치 기반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이를 통해 부디 더 많은 기업가들이 자아도취를 경계하며 겸손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
김용성 < IGM 세계경영연구원 교수 >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349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