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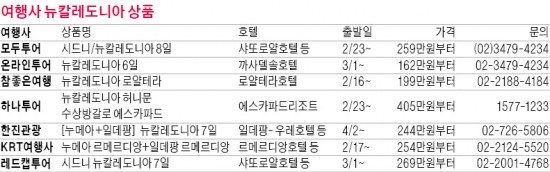
뉴칼레도니아의 수도 누메아로 들어서니 마치 작은 프랑스에 들어선 것 같다. 불어로 쓰여진 간판이며 프랑스풍 건축물에 모젤항 주변에 집결한 요트까지 더해지면 프랑스 남부의 니스나 방스를 옮겨 놓은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킨다. 누메아는 뉴칼레도니아 전체 섬에서 가장 현대화된 지역이다. 이 도시에는 25만명의 뉴칼레도니아인 대다수가 살고 있다.
누메아의 일상은 아주 천천히 흐른다. 누메아의 중심 지역인 코코티에 광장에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보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모젤항 주변의 아침시장에도 느긋한 평화가 깃들어 있다. 시장은 아주 작고 아기자기하다. 육각형의 푸른 색 지붕 아래 꽃과 장신구, 그날 잡은 것이 분명한 싱싱한 생선들을 팔고 있다.
시

원주민 삶 엿보는 치바우문화센터
뉴칼레도니아의 오래된 전통을 살피려면 세계 5대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치바우문화센터로 가야 한다. 부족 통합과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암살당한장 마리 치바우를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센터는 마치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그랬을 것 같은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지상에 내려앉았다. 마침 문화센터 안에선 ‘카낙쇼’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있었다. 원주민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이 공연은 엄숙하면서도 익살맞고, 생명의 환희와 생멸의 진지함을 고루 갖춘 뮤지컬처럼 가슴을 울린다. 치바우문화센터 내 다양한 전시물과 센터 뒤 전통가옥을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뉴칼레도니아는 에코투어로도 유명하다. 섬의 60% 이상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을 만큼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몽트뢰벨에 위치한 블루리버파크에서는 뉴칼레도니아의 생명력 넘치는 자연 풍광을 그대로 체감할 수 있다. 날지 못하는 새 카구를 비롯해 노투, 도로세라 등의 다양한 조류와 쭉쭉 뻗어 있는 수천 그루의 카오리 나무, 물에 잠겨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고사목까지 그야말로 살아있는 쥐라기공원을 연상케 한다.
아메데 섬의 등대가 압권
뉴칼레도니아의 정수를 느끼려면 일데팽으로 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진정한 천국을 느끼고 싶다면 주저없이 아메데섬을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일본의 여류작가 모리무라 가쓰라는 ‘천국의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소설을 통해 “천국이 섬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늘 가듯 건너가리”라고 노래했다. 그가 천국이라 말한 섬은 뉴칼레도니아의 우베아섬이지만 실제로 아메데에 가면 천국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도 있는 곳. 그 모든 자유가 허락된 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아메데는 바로 그런 곳이다.
아메데의 압권은 아무래도 등대다. 나폴레옹 3세 때 지은 등대는 정상까지 247계단이다. 숨이 턱에 차서 올라서면 360도로 펼쳐진 뉴칼레도니아의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섬 중앙에는 알록달록한 색의 우체통이 있는데 아메데섬의 풍광이 담긴 엽서를 사서 본국으로 부치는 관광객의 모습도 쉽게 눈에 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이제 천국과 이별할 시간이다. 원래 천국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며 우체통에 남기고 온 엽서처럼 뉴칼레도니아를 가슴에 담아 두었다.
여행팁

뉴칼레도니아는 연중 내내 봄 날씨 같다. 평균 기온은 15~32℃. 공용어는 프랑스어지만 멜라네시안 언어도 혼용해서 쓴다.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빠르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JAPAN NOW]2박3일 나가노여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M.38932129.3.jpg)





![[단독]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3287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