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통한 온정적 평등이 아닌
기업가 정신 불러내는 자유 늘려야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 교수·한국제도경제학회장 kwumin@hanmail.net >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등 과거 경제학은 철학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지만, 현대 경제학자들은 철학적 기반 없이 경제이론을 쏟아낸다고 누스바움은 개탄하면서 철학을 모르는 경제학자는 ‘줄 없이 줄타기하는 광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류 철학자의 강연 주제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시장경제는 종교, 도덕, 법, 정치, 국가 등 철학적 주제와 분리될 수 없는 복잡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규범적 인식을 위해서는 철학적 사유(思惟)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에서 경제교육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류경제학은 철학을 추방시켰다. 그래서 경제학과 철학 간 학제적 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통합할 철학의 성격이다. 나쁜 철학은 자유, 번영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협하는 경제학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주목할 건 누스바움이 상정하는 철학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다.
세계 100대 지성으로 꼽히는 이 철학자는 공공정책에서 ‘정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에게 정의란 노동, 교육, 상속 등에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하는 기회평등의 사회정의다. 연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그가 충고하는 ‘빈국에 대한 부국의 의무’ 같은 글로벌 정의도 한통속이다.
누스바움은 경제학이 자유에 대한 인식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지만 그에게 자유란 재정·지적 능력을 뜻하는 ‘적극적 개념’이기에 이런 사회주의적 자유는 강력한 정부 개입을 요구한다. 이쯤에서만 보아도 누스바움의 철학은 복지, 보건, 주택, 노동 등 약자 보호의 명분으로 정부의 경제통제를 뒷받침하는 밀 전통의 온정주의적 ‘평등철학’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철학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역동적 투자활동이나 새로운 기술, 지식의 창조도 기대할 수 없다. 기다리는 건 사회갈등, 빈곤, 실업, 저성장뿐이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겪는 경제 불안도 자유를 유린하는 첩첩이 쌓인 규제와 방만한 정부지출 때문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학에 필요한 건 간섭주의를 막는 ‘자유의 철학’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주류경제학은 그런 철학이 없다.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단순하고 정태적 자연관을 남용한 나머지,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들이 사는 시장을 수리 계량을 동원해 자원배분 ‘기계’로 오해하는 모형이론 제작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제학의 중심에는 영국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있다. 그는 풍성한 자유철학으로 보편적 풍요의 매력적인 시장비전을 제시해 19세기 자유의 꽃을 피웠던 스미스 전통을 단절시킨 역사적 거대 실수를 범했다. 그런 주류경제학은 감동적이고 생동하는 시장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에 20세기 평등철학으로 달콤한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하는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학이 한국 사회에도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원대하고 심오한 자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런 세력에 저항하면서 자유주의 경제학을 만든 인물들이 있는데 미제스, 하이에크, 뷰캐넌 등이 그들이다. 그 석학들은 자생적 질서, 자유의 법, 법치, 제한된 정부 등 자유의 철학을 경제학과 융합해 기업가 정신이 불러오는 창조와 혁신의 장엄한 힘을 보여줬다.
장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주류경제학이 그런 철학에 주목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 교수·한국제도경제학회장 kwumin@hanmail.n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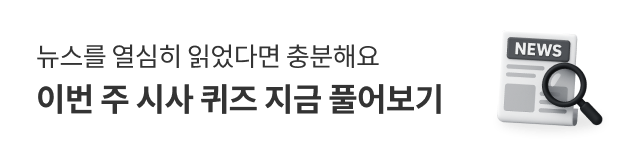
![[포토] 한복입고 소상공인 판매 부스 찾은 구윤철 부총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25427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