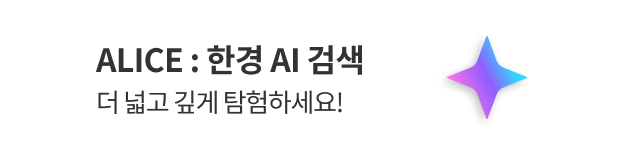온바오닷컴은 중국중앙방송(CCTV)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생활아침참고'는 지난 18일 보도를 통해 '웨이신 매춘' 실태를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CCTV 기자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베이징, 광저우, 선전, 항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웨이신의 '주변 찾기' 기능을 사용해 본 결과, 성매매를 시도하는 여성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실례로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남역, 허우하이, CBD 지역에서 웨이신의 '주변 찾기' 기능을 검색해 본 결과, 메인 사진 또는 사진첩에 노출사진이나 누드사진을 게재한 여성을 각각 5명, 7명, 4명 찾을 수 있었다. 심지어 정보란에 매춘 서비스 종류와 가격, 연락처까지 게재한 여성도 있었다.
항저우에서도 번화가 6곳에서 이같은 시도를 한 결과, 화면에 표시된 100명 중 최소 5명에서 최대 14명이 성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선전에서는 한 호텔에서 저녁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웨이신을 켜 놓은 채 기다린 결과, 무려 42통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메시지에는 모두 각양각색의 누드사진과 매춘 서비스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기자는 손님을 가장해 베이징남역에서 웨이신의 한 여성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곧바로 베이징사범대 인근의 한 주택가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의 지시대로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곧바로 "(성관계를 하려면) 300위안을 달라"며 가격 흥정에 들어갔다.
기자가 이를 거부하자, 놀랍게도 여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찾아도 된다"며 다른 여자를 소개해줬다. 확인 결과, 이 아파트의 7층, 9층, 10층과 옆 아파트의 7층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있었다.
심지어 웨이신을 통해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중개하는 조직도 있었다. 기자는 주변 검색을 통해 베이징 허우하이에서 웨이신을 통해 성매매를 중개하는 브로커를 만나게 됐다. 이 남자는 "여자는 모두 165cm 이상에 18~23세까지 다양하다"며 "한 번 하는데 800위안(13만8천원), 하룻밤을 자는데는 1천5백위안(26만원)"이라고 말했다.
흥정 후, 남자는 기자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으며 30분 정도 기다리자 한 여성이 들어왔다. 여자가 브로커에게 800위안을 주자, 브로커는 곧바로 호텔에서 사라졌다. 기자는 "매춘녀와의 대화에서 조직에 소속된 매춘녀가 수십명이며 모두 웨이신을 통해 이같이 매춘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만약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에는 고객을 위협하기도 했다. 기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매춘녀는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건 후 기자를 바꿔줬으며 남자는 "만약 하지 않을거면 서비스비로 3천위안(54만원)을 내라"며 협박했다. 수차례의 협박에 "돈을 안 내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자, 기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매춘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같이 웨이신을 통한 성매매가 확산되자, 경찰과 웨이신 운영업체인 텐센트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항저우에서는 지난 6월 웨이신을 통해 성매매를 중개한 조직을 검거했는데 관련 용의자만 62명에 달했다.
텅쉰 측 관계자는 "웨이신을 통해 음란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춘을 비롯해 도박, 폭력 등 관련 정보가 적발되면 즉시 계정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아예 퇴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웨이신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만큼 정부 차원에서 실명제 강화, 적발시 엄중 처벌 등의 법규를 마련해야만 이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웨이신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웨이신으로 주변 검색을 해보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젊은 여성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스스로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들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다. 관광객이 성매매를 시도하면 자신의 QQ(중국의 대표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줘 친구를 맺은 후, 숙소로 찾아가거나 업소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중국과 달리 주변인물 정보제공서비스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중국인 성매매업자들은 중국 SNS서비스인 웨이신을 이용한 중국어 성매매 알선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