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노사합의' 우선… 정당주도 입법화 안돼"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주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입법화보다 노사정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학계 전문가의 발언이 당·정·청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과거 3년치를 소급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법원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할지 불분명하고 기업마다 임금 지급기준이 다양해 획일적 적용도 어렵다"며 "통상임금 소송 남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임금 결정의 근간인 노사 자치를 배제하고 '추상적' 법률 규정에 의해 판단함에 따라 현장에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다수 기업은 판례와 행정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정했을 뿐인데 갑자기 3년치 소급 지급분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사 자율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자의적으로 통상임금의 법리를 변경하는 일은 가능한 삼가고, 모법(母法)인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와 기준 설정을 명시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한 입법권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사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노사 협의를 통한 임금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안과 함께 기업 경영실적 연동 성과급(변동상여금) 활성화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임금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기업의 임금 유연성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상임금 논란은 노사 협의를 비롯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3년치 소급분을 요구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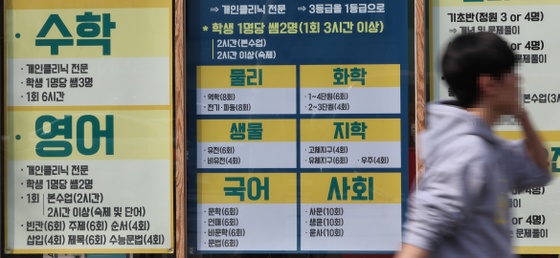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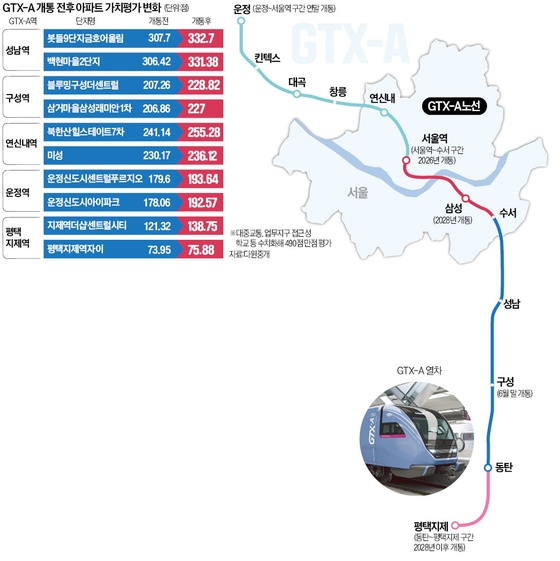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베스트셀러] 서점가도 푸바오앓이…'전지적 푸바오 시점' 단숨에 1위](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5989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