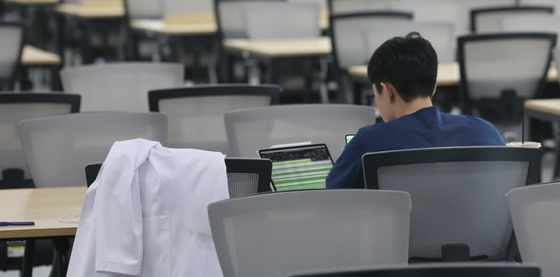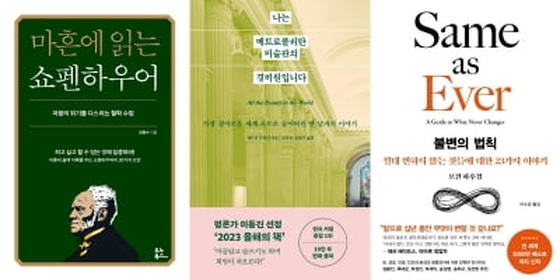[미국경제학회 연례 총회] "위기땐 중앙銀-정부 협력 바람직" vs "돈 풀 재량권 누가 줬나"
양적완화 찬성
블라인더 교수 "금융시스템 붕괴 예방위해 정부와 협력은 불가피"
콘 前 Fed 부의장 "양적완화 정책 펼칠 땐 이유·목표 명확히 설명을"
양적완화 반대
멜처 교수 "돈 찍는다고 문제해결 안돼…제로금리로 퇴직자 삶 악화"
불러드 연방은행 총재 "통화정책 독립성 잃으면 거시경제 안정화에 문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전화를 받길 거부했다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
“헌법상 통화정책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 중앙은행은 대리인일 뿐이다. 누가 Fed에 의회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풀 재량권을 줬나.”(앨런 멜처 카네기멜론대 교수)
지난 3일부터 미국 샌디에이고 맨체스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3년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의 최대 화두는 통화정책이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이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로 등장한 영향이다. 그런데다 올해는 Fed 설립 100주년이어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독립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중앙은행-정부 협력 어디까지
가장 치열한 논쟁은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놓고 벌어졌다. 대부분 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직전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압력에 못이겨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세입·세출 등 재정정책은 거시경제 충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통화정책이 독립성을 잃으면 거시경제 안정화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Fed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1994~1996년 Fed 부의장을 지낸 블라인더 교수는 “Fed는 물가 관리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도 가지고 있다”며 “2008년 Fed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협력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반면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Fed는 금융위기 이후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했다”면서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독립성을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테일러 교수는 Fed, 한국은행 등이 금리 결정시 사용하는 ‘테일러 준칙’으로 유명한 통화정책의 세계적 권위자다.
○양적완화 정책 계속해야 하나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멜처 교수는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로금리(연 0~0.25%) 정책 탓에 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퇴직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농경지 가격이 치솟는 등 거품 조짐도 보이고 있다”면서 Fed의 통화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UC버클리의 데이비드 로머와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는 “Fed가 1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때는 통화정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 정책도 내놓지 않다가 대공황과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야기한 1930년대와 1970년대”라고 지적했다. 부부지간인 두 교수는 “통화정책의 힘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중요” 공감대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대부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시장과의 투명하고 긴밀한 소통이었다. 도널드 콘 전 Fed 부의장은 “양적완화같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할 때는 그 이유와 목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우드퍼드 컬럼비아대 교수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라인더 교수는 “1920년부터 1944년까지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몬터규 노먼은 ‘중앙은행은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면서 “그러나 노먼 총재는 틀렸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최태원 "SK 성장史 부정 판결 유감…진실 바로잡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33785387.3.jpg)
![[속보] 최태원 "심려끼쳐 죄송…SK·국가경제 영향 없도록 소임 다할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8561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