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감동정치'에 매달리지 말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독일병’을 고치기 위해 노동개혁을 펼친 사회민주당의 전임 슈뢰더 정권보다 한발 더 나아간 개혁이다. 개혁의 탓이었을까. 그가 속한 기독교민주당의 지지율은 2010년엔 3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 경제위기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최근 국민의 66%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혁은 인기없는 '고난의 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1979년 집권하자마자 ‘영국병’을 고치는 데 앞장섰다. 만성적인 파업과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부지출 삭감을 밀어붙였고 강력한 노조의 저항에 끝까지 싸워 이겼다. 그의 개혁은 경제학자 300여명이 반대성명을 내는 등 만만치 않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고, 지지율이 25%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침공으로 시작된 포클랜드섬 영유권을 둘러싼 전쟁에서 승리해 80%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3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개혁과정은 그에게 고단한 여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처나 메르켈과 비슷한 리더십으로 비유되곤 한다. 여성, 이공계, 보수정당 출신이란 공통점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닮은 꼴이 되려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단가 문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 등이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
개혁은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노조권력이 약화되고 노사관계가 개선된 것은 사회여론주도층이 끊임없이 노조권력을 압박했기에 가능했다. 기득권층에 압박을 가하지 않고 개혁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모두 살 수 있는 길은 성장뿐
개혁을 위해선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받거나 감동을 주려는 정치는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 박 당선인에게 당면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어떻게 하면 질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성장이 필요하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려는 성급하고 튀는 행동보다는 묵묵히, 그러면서도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의욕만 넘쳐 무조건 “전봇대를 뽑으라”(이명박 대통령)고 지시하거나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 “코드를 맞추라”(노무현 전 대통령)는 리더십으론 국민대통합이나 건전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민주화나 일자리 등의 달콤한 얘기는 모두 잊어버리고 경제성장의 해법을 짜내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5년 뒤 국민들의 가슴에 든든한 리더로 남고 싶다면 너무 튀고 감동을 주려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이다.
윤기설 한경좋은일터연구소장 upyk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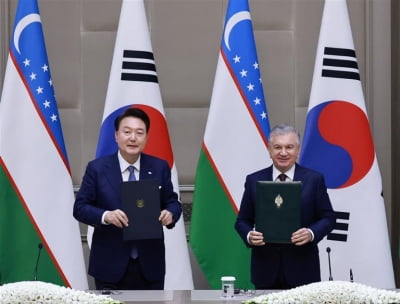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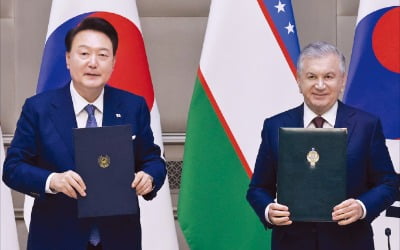











![[오늘의 arte] 전준혁 발레리노 독무, 너무 인상적](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3208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