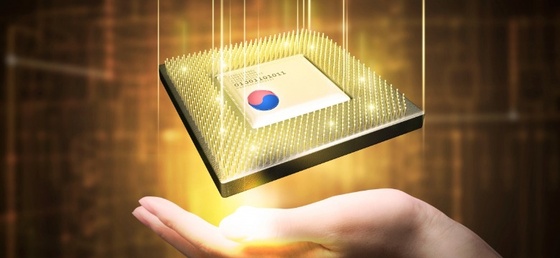렌즈로 포착한 권력의 허위의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청담동 표갤러리 사우스에서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 노세환 씨(34·사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속도감 있게 도심과 시골의 일상을 담아온 젊은 사진 작가다. 그는 “사진은 움직이는 사물의 정지된 장면을 포착하지만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데 카메라 렌즈를 활용한다”며 “엄연히 존재하는 진리를 포장해 대중을 호도하는 권력의 허위의식 사진 미학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경희대와 런던 스레이드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노씨는 최근 거리 풍경을 담는 데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한 ‘메이킹 포토(만드는 사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나무 작가’ 배병우 씨에게 사진을 배운 그는 중앙미술대전 작가상, 송은미술상을 받으면서 주목받았다.
‘멜트다운(Melt down)’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바나나, 사과, 병, 피망, 의자, 장난감 집과 같은 소품들을 흰색, 붉은색 페인트에 담갔다 건져 올린 다음 촬영한 근작 20여점을 내보인다. 전위적인 사진들이 넘치는 시대에 반발하듯 은유의 본질에 충실한 함축적이고 정제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는 “권력의 횡포를 카메라 기법으로 건드리면 직설적인 묘사 없이도 관객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사진을 통해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보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테이블 위 파프리카는 달콤한 설탕시럽을 끼얹은 듯 액체가 끝없이 녹아내린다. 사과와 바나나는 나무 막대에 꿰어져 있지만 정면에서는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관람객이 바라보는 사진 속의 사물에서 줄줄이 흘러내리는 흰색, 붉은색 페인트는 ‘녹는(melting)’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면서 ‘굳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다만 관람객은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낄 따름이에요.”
정치 권력의 횡포에 대한 사회의 냉랭한 시선과 편견을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메이킹 포토 기법으로 잡아냈다는 설명이다.
“권력은 대중매체를 장악해 대중을 우중(愚衆)으로 만들려는 모의를 끊임없이 시도하죠. 그렇게 보이거나 알려진 것은 단지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력은 힘을 이용해 어떤 흐름의 현상을 가리켜 ‘녹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굳는 것’이에요.” 전시는 내달 8일까지. (02)511-5295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베네치아 비엔날레 섹션 인상 깊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51711.3.jpg)

![[이 아침의 시인] '소나기' 황순원의 맏아들…첫사랑 DNA로 쓴 연애詩 황동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4973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