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두 선수가 우승경쟁을 벌였던 위스콘신주 콜러 블랙울프런의 챔피언십코스에서 US여자오픈이 14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추아시리폰의 근황을 전했다. 당시 두 선수는 18홀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서든데스 2개홀까지 20개홀을 돌며 혈전을 치렀다.
일찌감치 골프를 그만두고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가족임상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추아시리폰은 “세계 최고의 선수와 겨룰 수 있던 그때를 돌아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그때가 내 골프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때 박세리는 L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고 대기업 삼성의 후원을 받는 선수였지만 추아시리폰은 오빠가 캐디를 맡고 갤러리 가운데 그를 응원하는 사람은 가족과 듀크대 친구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추아시리폰은 이후 골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는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져 부담스러웠던 데다 기대한 만큼 성적도 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듀크대에서 추아시리폰을 가르쳤던 코치 댄 브룩스는 “제니는 재미를 느껴야 잘하는 스타일인데 US여자오픈의 경험이 압박감을 주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듀크대 졸업 후 프로로 전향한 추아시리폰은 스폰서도 구하지 못했다. 때문에 그는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전부 나에게 투자했지만 낭비라고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가까운 친구였던 짐바브웨 출신 골프선수 루이스 치텡와가 2001년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것도 그의 인생이 바뀐 계기가 됐다. 추아시리폰은 “인생이 덧없다는 걸 느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클럽을 내려놓은 뒤 그는 2005년 메릴랜드대 간호학과에 입학했고, 재작년 임상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며 1년에 두어 번 골프를 즐긴다는 그는 “환자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됐다”고 했다. 또 “가끔 그때 우승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족해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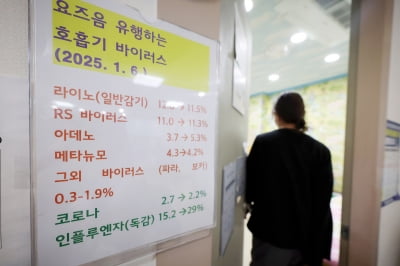
![[단독] "5년치 일감 쌓여"…미국서 '돈벼락' 맞은 한국 기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0957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