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골프대장' 오바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8년 재임 중 800여 차례나 골프를 쳤다. 하루 18홀씩 라운드를 했다면 골프장을 찾은 날이 꼬박 2년을 넘었다는 얘기다. 백악관에 연습 그린을 만들어 놓은 건 물론 집무실에서 8번 아이언으로 스윙 연습을 하면서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 폐쇄적 회원제로 운영되는 오거스타 내셔널GC 회원으로 가입해 라운드를 즐기는 꾀를 내기도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멋진 스윙 폼을 지닌 데다 핸디캡도 낮은 ‘고수’였지만 은밀히 골프를 즐기는 쪽을 택했다. 라운드하는 사진을 찍는 건 절대 금지였다. 전임 아이젠하워가 툭하면 골프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골프 매너는 별로 좋지 않아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려고 신경을 자극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속된말로 ‘구찌’가 심했던 것이다.
빌 클린턴도 8년 재임 기간 동안 400여 차례 라운드를 했다. 멀리건을 자주 받아 ‘빌리건’이란 별명을 얻었지만 골프에 대한 집착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브루나이에서 정상들과 만찬을 한 뒤 조명시설이 갖춰진 골프장을 찾아 심야 우중(雨中) 골프를 즐겼을 정도다. 1996년 재선을 앞두고 실시한 ‘대통령의 휴가’ 여론조사에서 ‘골프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재임 중 100회 라운드를 넘긴 오바마 대통령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로부터 ‘골프대장(Golfer-in-Chief)’이란 공격을 받고 있다. 할 일이 태산인데 한 번에 4시간여나 걸리는 골프에 빠진 건 빈약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드러낸 것이란 비난이다. 아이젠하워나 클린턴에 비하면 라운드 횟수가 훨씬 적은 데도 집중공격을 받는 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골프장을 찾은 게 화근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한다.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전개되던 도중이나, 태풍 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는 등 ‘눈치 없는 라운드’가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09년 윌리엄 태프트 이후 미 대통령 18명 중 15명이 골프를 즐겼다.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이 골프를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주치의의 생각은 이랬다. “골프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미치광이를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젠하워나 클린턴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보면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골프를 슬쩍 눈 감아준 것도 같다.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에게 골프가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다.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
케네디 대통령은 멋진 스윙 폼을 지닌 데다 핸디캡도 낮은 ‘고수’였지만 은밀히 골프를 즐기는 쪽을 택했다. 라운드하는 사진을 찍는 건 절대 금지였다. 전임 아이젠하워가 툭하면 골프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골프 매너는 별로 좋지 않아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려고 신경을 자극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속된말로 ‘구찌’가 심했던 것이다.
빌 클린턴도 8년 재임 기간 동안 400여 차례 라운드를 했다. 멀리건을 자주 받아 ‘빌리건’이란 별명을 얻었지만 골프에 대한 집착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브루나이에서 정상들과 만찬을 한 뒤 조명시설이 갖춰진 골프장을 찾아 심야 우중(雨中) 골프를 즐겼을 정도다. 1996년 재선을 앞두고 실시한 ‘대통령의 휴가’ 여론조사에서 ‘골프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재임 중 100회 라운드를 넘긴 오바마 대통령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로부터 ‘골프대장(Golfer-in-Chief)’이란 공격을 받고 있다. 할 일이 태산인데 한 번에 4시간여나 걸리는 골프에 빠진 건 빈약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드러낸 것이란 비난이다. 아이젠하워나 클린턴에 비하면 라운드 횟수가 훨씬 적은 데도 집중공격을 받는 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골프장을 찾은 게 화근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한다.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전개되던 도중이나, 태풍 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는 등 ‘눈치 없는 라운드’가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09년 윌리엄 태프트 이후 미 대통령 18명 중 15명이 골프를 즐겼다.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이 골프를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주치의의 생각은 이랬다. “골프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미치광이를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젠하워나 클린턴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보면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골프를 슬쩍 눈 감아준 것도 같다.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에게 골프가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다.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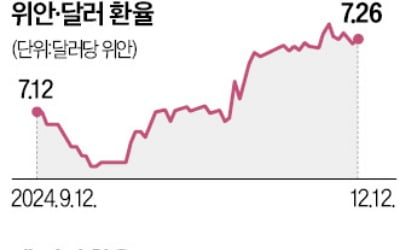
![[포토] 농장 상속세에 뿔난 英 농민…런던서 트랙터 시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2373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