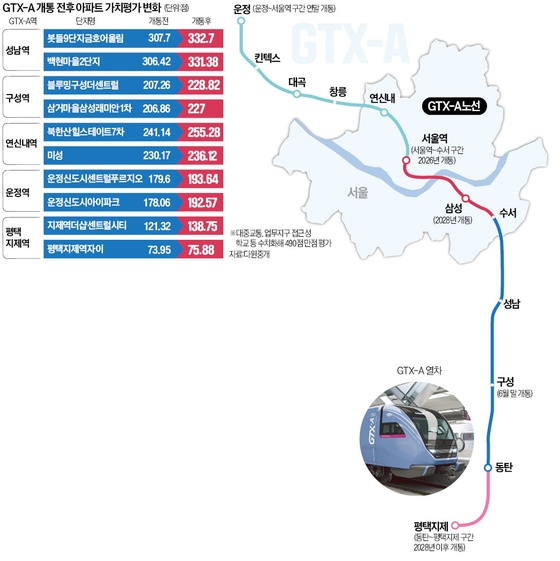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우주 초기' 연구에 집착하는 까닭은…과학 원리ㆍ생명의 기원 풀 열쇠 있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왜 물리학자들은 우주 초기 모습에 집착하는 것일까.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우주의 탄생과 끝에 모든 과학기술의 원리와 생명의 기원,학문의 근원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주가 한 점에서 대폭발해 현재에 이르렀다는 '빅뱅'이론은 정설이다. 약 137억년 전에는 우주의 크기는 제로에 가까운 점이었고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였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해 온도가 내려갔고,그 과정에서 광자 전자 중성미자 양성자 중성자 등이 생겨났다. 모두 물리학과 전자기학의 핵심 개념들이다.
또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력을 이기고 움직이다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중수소가 생기고,여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계속 붙어가면서 헬륨 리튬 베릴륨 등 원자핵이 생겨났다. 중 · 고교 화학시간에 배웠던 '수헬리베…', 바로 원소주기율표상의 원소들이다.
빅뱅 후 수백~수천만년 동안은 광자가 입자들과 강력하게 붙어 있어 우주공간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해 우주가 깜깜했다. 이 시기가 '암흑시대'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의 온도가 수천도로 떨어지면서 전자와 원자핵들이 결합돼 원자가 됐고, 광자가 풀려나면서 우주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때가 이번 두 연구성과의 배경인 '우주 초기'다.
그런데 원자들이 생겨나면서 우주의 밀도가 불균형해지고 밀도차에 따라 물질들이 응축되면서 '은하'들이 탄생했다. 또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뭉쳐지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핵융합반응에 따라 빛을 내는 별이 탄생했다. 태양은 은하계에 존재하는 약 2000억개의 별 중 하나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의 주제 역시 '초신성' 연구를 통해 우주의 지속적 팽창을 입증한 것이다. 큰 별들은 늙어 최후를 맞을 때 한 은하계 전체보다 강렬하게 빛을 뿜어내는데,이를 초신성이라고 한다. 이 교수는 "이번 두 연구결과는 암흑시대와 우주 초기 별들의 생성과 진화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사망까지 갈 수도" 무서운 경고…요즘 급증한 전염병 뭐길래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3666679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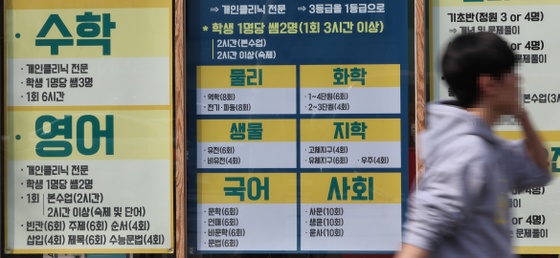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