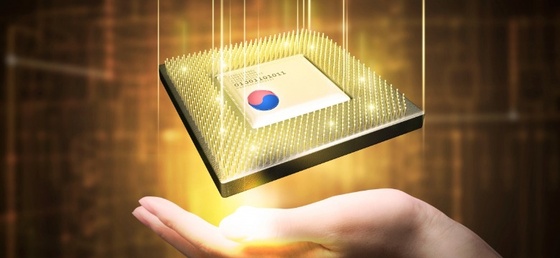반환점 돈 장외파생상품 심의제 '절반의 성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가 지난 10일로 반환점을 지났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투자회사가 일반인 등을 상대로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금융투자협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2008∼2009년 정치권을 달궜던 '키코(KIKO) 논란'이 놓여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는 원·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있을 때는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한 범위의 하단을 밑돌면 '계약무효(녹아웃)'가 되고 계약 범위를 웃돌(녹인)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을 팔아야 하는 상품이다.
당시 민주당 등이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 구사가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환율이 급등, 우량 수출 중소기업이 막대한 손실(2008년 10월 정부 추정 규모 3조원)을 입게 됐다는 점을 공론화하면서 경제 현안으로 부상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키코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맥락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심의제도를 활용, 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모두 11차례의 회의를 열어 31건의 상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키코와 유사한 녹아웃 형식의 통화옵션상품을 포함, 4건의 상품의 설명에 대해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약식심사의 대상을 전문투자사 대상상품이나 선물환, 통화스와프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심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해 업무 처리를 신속하면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런 위원회의 노력으로 금융업체 스스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금투협측은 자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은행권 등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사전심의제도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심의 대상이 신규 상품으로만 제한돼 있는데다 상품 구조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품 설명 등의 심의에 집중했다는 판단에서다.
금투협측도 "금융기관이 내놓은 상품을 마지막에 한번 더 스크린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에서 장외파생상품 전문가 육성 및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과 같이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을 당시의 목적이 달성됐는지도 시장의 판단이 엇갈린다.
금투협 관계자는 "올해 말 종료되는 사전심의제도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래 관행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